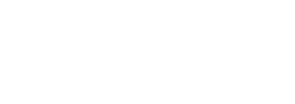고단한 현실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여자…
가족을 위해 고통스러운 현실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 『환영』. <나쁜 피>의 작가 김이설이 선보이는 두 번째 장편소설로, 계간지 ‘자음과모음’ 2010년 봄호와 여름호에 분재했던 것이다. 무능력한 남편 대신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어머니이자, 여자인 윤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친정 가족들은 그 모든 책임과 의무가 윤영에게만 있는 것처럼 돈을 요구하고, 남편은 이렇다 할 삶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 늘어가는 빚과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윤영은 결국 젖먹이를 떼어놓고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일을 하게 된다. 게다가 별채에서 맞이하는 손님들은 그녀를 성적 노리개로만 여기며 모욕감을 안겨주는데….
김이설
저자 : 김이설
저자 김이설은 1975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다.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단편 「열세 살」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작품으로는 장편소설 『나쁜 피』(2009), 소설집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들』(2010) 등이 있다.
1. 왕백숙
2. 그따위의 나날들
3. 삼복더위
4. 최악과 최선
5. 어서 오세요
작가의 말
『나쁜 피』 김이설 작가 새 장편소설!
2006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한 장편 『나쁜 피』를 2009년 동인문학상 최종심 후보작 4편에 올리며 쟁쟁한 선배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소설가 김이설이 두 번째 장편소설 『환영』을 출간했다. 동인문학상 최종심에 올라갔을 때 심사위원회에서는 “2006년 등단 이후 지금까지 소설집 한 권 묶지 않은 신예가 첫 장편으로 단숨에 동인문학상 본선에 진출했다”며 “간결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문체로 첫 문장부터 독자를 사로잡는 솜씨가 일품”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김이설의 작품은 환상이나 꿈을 현란하게 요리하거나 내면의 세계를 난해하게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정면으로 파고든다. 신작 장편소설 『환영』은 문예계간지 『자음과모음』(2010년 봄호~2010년 여름호)에 분재되었던 소설로, ‘가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져 고통스러운 현실과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마치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건조하면서도 사실적인 묘사들은 맹렬한 스피드와 강한 흡입력으로 불편한 현실을 직조해낸다. 그 ‘불편함’ 속에 담긴,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냉소와 그와 대비되어 보이는 삶에 대한 뜨거운 의지는 『환영』이라는 소설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울림으로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고단한 현실은, 오늘도 어서 오라고 손짓한다.
―지독한 삶의 무게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여자, 윤영
시와 도 경계의 표지판이 멀리서도 번쩍였다. 안녕히 가십시오. 반대 차선에서는 어서 오세요, 라고 쓰여 있을 터였다. 아침마다 안녕히 잘 가시라는 말 때문에 다른 세계로 들어선 것 같았다. 그런데 밤이 되어 되돌아오는 여기도 다른 세계 같았다. -본문 중에서
인간의 삶에 부여되는 행복은 과연 누구에게나 공평할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이 겹쳐서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김이설 작가의 장편소설 『환영』을 다 읽는 순간 이런 물음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대물림되는 경제적 결핍과 비참한 현실의 반복, 작중 인물인 윤영의 눈앞에 닥친 일들은 상상하기조차 힘겹다. 매일 아침 시와 도의 경계를 가르는 ‘안녕히 가십시오’라는 표지판을 보며 다른 세계로 발을 들이는 윤영. 그곳은 항상 ‘어서 오세요’라고 그녀를 ‘환영’하는 듯하지만, 다른 세계에서의 그녀는, 그리고 밤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이 세계에서의 그녀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다.
『환영』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는 무능력한 남편 대신 생계를 위해 젖먹이를 떼어놓고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계속해서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게 되는, 한 가족의 가장이자, 어머니이자, 여자인 윤영의 이야기다. ‘돈’ 때문에 가족을, 생활을, 몸을 잃어야 했던 윤영의 참혹한 현실은 소설 안에서 노골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드러난다. 대를 이어 내려온 가난과 남편의 무능력이 그녀에게 가져다준 것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빚과 당장의 생활비조차 없어서 결국에는 젖먹이를 떼어놓고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다.
“듣기 싫어! 미안하단 말은 공짜지! 당신이 뭘 안다고! 시끄러워!”
내가 소리를 지르자 아이가 기겁을 하고 제 아빠의 품에 안겼다. 앉아 있는 남편에게 마주 안긴 아이의 등이 숨을 쉴 때마다 파닥거렸다. 아이가 뒤집고, 이가 나고, 기어 다니고, 혼자 앉고, 말을 시작하는 걸 지켜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남편이었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는 것도 남편이었다. 아이에게 아빠는 엄마였다. 벽에는 아이의 낙서들이 액자처럼 붙어 있었다. 못 보던 장난감도, 그림책도 구석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본문 중에서
윤영에게는 탈출구가 없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친정 가족들은 그 모든 책임과 의무가 마치 윤영에게만 있는 것처럼 걸핏하면 윤영에게 돈을 요구하고, 무능력한 남편은 애를 보거나 살림을 하면서 얼굴색만 좋아질 뿐 이렇다 할 삶의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모두 윤영에게 떠넘긴다. 게다가 별채에서 맞이하는 손님들, 왕백숙집 사장과 그의 아들마저 그녀를 성적 노리개로만 여기며 견디기 힘든 모욕감을 던져준다. 윤영의 앞에 놓인 삶은 이렇게 읽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럽고 불편하다. 윤영은 항상 자신 때문이 아니라, 윤영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즉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지만, 그것을 또 묵묵히 받아들임으로써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한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픽션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잘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삶의 질적인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치열하게 싸워도 올라갈 수 없는 나무가 지금 이곳에는 엄연히 존재한다. 김이설 작가는 이번 소설 속에서 이러한 불공평한 현대사회의 이면을, 자의든 타의든 삶의 벼랑 끝에 내몰려 기본적인 인간 윤리마저 말소된 듯한 인간들을 상대하며 삶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윤영의 모습을 강렬하면서도 간결한 문장으로 재현함으로써 바로 우리가 눈감고 싶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