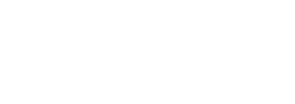오렌지 공화국으로 초대합니다!
1999년 문예지 ‘문학사상’으로 문단에 등단한 소설가 노희준의 『오렌지 리퍼블릭』. 2006년 첫 번째 장편소설 <킬러리스트>로 제2회 문예중앙 소설상을 받으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은 저자의 두 번째 장편소설이다. 우리 사회의 중심부라고 할 만한 ‘강남’을 겨냥하여 누구나 들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강남 오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중학생 시절까지 왕따였던 ‘노준우’가 고등학생이 되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머리’를 이용하여, 강남 정치인가 부자의 아들딸이 속해있는 잘나가는 그룹에 들어가면서의 일상을 중점적으로 담아냈다. 강남에서 부모 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향락적 소비문화를 즐기던 오렌지족의 은밀하고 흥미로운 삶을 엿보게 된다.
노희준
1973년 서울에서 출생해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하여 2006년 제2회 ‘「문예중앙」 소설상’을 수상하였다. 소설집으로 창작집 『너는 감염되었다』(랜덤하우스중앙, 2005), 『X형 남자친구』(문학동네, 2009)가 있고, 장편소설로는 『킬러리스트』 (제2회 「문예중앙」 소설상 수상작, 랜덤하우스중앙, 2006)가 있다. 현재 작가 밴드 ‘말도안돼’에서 보컬을 맡고 있다.
1. Orange, The Beginnings
2. Sex, Lies and Videotape
3. I’m the One
4. 저 창가에 햄버거
5. Appetite for Destruction
6. Two-Toe Pedaling
7. 내 머릿속에 카메라
8. Welcome to the Jungle
9. We’re the un
10. Origin, Original, Originality
11. The Public Confidential
12. The Secret Agent
13. 입속의 검은 눈
14. Frankenstein Girl
15. Orange, The Afterwards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영토나 정통성 따위 중요치 않았다.
엄청난 부(副)가 그들을 규정지은 것은 아니다.
외려 그 부를 통해 드러난 ‘문화’가 그들에겐 유일한 국경이었다.
온 나라가 민주화의 열기에 들떴을 때, 그들은 민주화 이후를 걸어야 했다.
그들은 하나의 국가를 건설했다.
세상에 대한 짜릿한 복수!
Orange Republic.
영토나 정통성 따위 중요치 않았다.
엄청난 부(副)가 그들을 규정지은 것은 아니다.
외려 그 부를 통해 드러난 ‘문화’가 그들에겐 유일한 국경이었다.
온 나라가 민주화의 열기에 들떴을 때, 그들은 민주화 이후를 걸어야 했다.
그들은 하나의 국가를 건설했다.
Highway To The Orange Republic
2006년 첫 번째 장편소설 『킬러리스트』로 제2회 ‘문예중앙 소설상’을 수상하며 평단의 큰 주목을 받은 노희준 소설가가 두 번째 장편소설을 발표했다. 그는 그간 우리 사회 이면의 병리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온 작가로 이번 소설에서는 그 시선을 우리 사회의 중심부라 할 만한 ‘강남’에 겨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강남 오렌지’에 대해 쓰고 있는데, 누구나 들어봤지만 아무도 모른다 할 수 있는 ‘오렌지족’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 소설 속에서 펼쳐진다.
마치 새로운 종족이 나타난 양 오렌지 ‘족(族)’이라 불리던 그들, 부모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강남 일대의 향락적인 소비문화를 즐기던 그들은 1970~80년대 경제 성장의 수혜자인 부유층 2세이거나 강남에 자리 잡은 부모들의 부를 바탕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부류가 대부분이었다.
세 개의 종자가 있었다. 우선은 재래종인 ‘감귤’. 개발 전부터 살던 원주민이거나 개발 초기에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들어온 사람들로, 운이 좋은 편이기는 했으나 부자라고는 할 수 없었다. 신흥 귀족을 형성한 것은 80년대에 유입된 외래종으로 그들 중 일부가 이후 ‘오렌지’로 불리게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강을 건너온 ‘탱자’가 있었다. 강남에 살지만 온몸으로 강북인 애들.
– 본문 중에서
주인공 노준우는 중학교 때까지 왕따였다. 키도 작고 소심한 성격에 물론 빽도 없었다. 청담동 회계사 아들이라 할지라도 당시 오렌지 공화국에서 그 정도는 일반 시민에 속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왕따 콤플렉스로부터 벗어난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인 ‘머리’를 이용해 소위 잘나간다는 그룹에 접근하게 된다. 그 그룹에는 국회의원의 아들딸들, 강남 부자의 아들딸들이 속해 있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여자친구가 될 신아를 만난다. 신아는 강북 부자의 외동딸이다. 권위적인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불철주야 몸부림치는 오렌지였다. 집사와 외제차는 기본, 온 집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앞에서 하는 자위는 그녀의 나쁜 취미였다.
그들에게는 써야 할 돈과, 써야 할 싱싱한 몸이 있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산방식은 소비였다.
우리는 타고난 유전자가 정점에 도달하는 스무 살 무렵에 살아 있었다. 잡티 하나, 흠집 하나 없는 순결한 피부. 쓸모없는 살은 한 점도 갖고 있지 않은 완벽한 몸매. 무슨 옷이건 맞춤처럼 피팅되는 축복받은 옷걸이. 청바지의 워싱라인을 잘라낼 필요가 없는 1미터 이상의 하체와 무릎 부분이 꺾이지 않는 일자형의 다리 라인. 작은 얼굴과 높은 코와 긴 손가락과 가는 발목을 갖고 있었다.
우리는 신세대가 아니라 신인류였다.
– 본문 중에서
오렌지 리퍼블릭에 입국한 준우에게 그들 그룹은 지위의 우월함과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선물한다. 그들은 평소 맘에 안 드는 선생님을 골려 먹거나, 강남이라면 무조건 껌벅 죽는 이들을 농락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강남’ 출신이라는 것을 무기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가지고 노는(특히 여자를 상대로) 치들에 대한 따끔한 복수를 시작한다. 어느 날 그들은 이태원으로 출동하여 ‘강남’이라는 무기로 여자를 꼬신 다음 마약이나 수면제를 이용해 여자들을 범하는 무리들에게 접근한다. 준우와 하진은 그들의 여자친구인 신아와 예은을 그들에게 접근시킨 후 같이 술을 마신 다음, 그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일라치면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에 대한 응징을 한다. 그런데 하루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신아와 예은이 보이지 않았다. 준우와 하진 주위에서 그치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야 하는데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었다. 상황을 파악한 둘은 재빨리 가게를 벗어나 주위를 찾아 헤맸다. 그리고 저 멀리 다 낡아 깜빡거리는 여인숙 네온사인 밑으로 축 늘어진 둘을 끌고 들어가는 두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모습을 본 둘은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있어 청춘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불꽃 없이 연소해야만 하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원인이나 이유, 결과에 대해서는 애초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준우는 자신이 해온 복수와 일탈의 행위들이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가하는 복수임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심판도 선수도 없는 영원의 콜로세움에서 치러지는 한 편의 모노드라마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감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같이하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를 여행을 떠난다.
속도계가 170을 치자 길이 좁아졌다. 동작을 멈춘 거대 로봇처럼 엎드려 있는 컨테이너 트럭을 지나칠 때마다 차가 휘청거렸다. 핸들이 안마기처럼 떨기 시작했으나 액셀을 더 밟자 오히려 잦아들었다. 석유를 채워놓은 듯 검실거리는 바다에 먼눈팔자 속도에 대한 공포조차 사라졌다. 길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의 경계를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속의 최면은 부산대교에 올라서자 우리를 비현실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다. 중력은 검은 바다 속으로 추락하고 길이 사라진 허공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물안개가 펼쳐져 있었다. 신아의 손을 깍지 끼어 잡으며 나는 하얀 무늬들의 꿈틀거림만 남고 모든 게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간 따위는 없어져버리고 한없이 달려가는 신아와 나의 속도만이 존재했으면. 신아와 나의 이름조차 사라져 함께 맞잡고 있는 이 손의 감촉만 남았으면. 우리는 하나이자 전부로 지금 이곳에 살아 있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인생의 어느 한때에, 우리는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영원했었다.
세상의 모든 안개가 우리를 향해 침묵하고 있었다.
– 본문 중에서
작가는 이번 소설 『오렌지 리퍼블릭』을 통해 그간 우리 문학에서 거의 다루어진 적 없는 90년대 강남에 대해 이야기하며, 우리가 강남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부자와 그들의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소설을 통해 도덕적 판단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문학에서조차 이미 색안경을 끼고 그들을 바라봐온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의 압구정, 청담동에 원주민인 ‘감귤족’과, 신흥부자로서의 외래종 ‘오렌지족’, 또 강북에서 월강해 터 잡은 어중간한 ‘탱자족’이 있었다는 걸 이 소설로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압구정 청담동 일대의 내밀한 풍속화지만, 우리 모두가 지향해 마지않았던 헛된 꿈의 부스러기들이기도 하다. 재미있고, 섬뜩하고, 쓸쓸하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가열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현재진행형 이야기다. 청담동 ‘감귤족’으로서 왕따의 전설을 거쳐 나온 노희준이 최종적으로는 오렌지족에의 헛된 지향을 버리고 본래의 자리로 되 구부러져 와 마침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이면서 동시에 아름다운 선언서로도 읽힌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자만이 갖는 당당한 목소리가 이 소설의 뒷배에 담겨 있다.
– 박범신(소설가)
흘러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라고 작가는 썼다. 곪을 것은 곪고 터질 것은 터져버린 2010년, 서늘한 시선으로 되돌아보는 우리의 90년대. 다시 오지 않아도 좋을 청춘은 없으리. 문장과 문장은 아교처럼 연결되어 첫장과 끝장이 순식간에 만난다.
세다. 입속에 남아 가시지 않는 청양고추의 매운맛에 찬물을 들이켜듯, 이야기의 끝을 찾아 읽고 또 읽게 만든다. 암울한 청춘들은 들썩이던 강남의 오렌지 문화에 휩쓸려 어디가 끝인지를 굳이 확인해보는 것이다.
– 말로(재즈 싱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