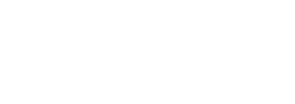권지예 장편소설『사임당의 붉은 비단보』. 늘 자유를 갈망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임당이지만,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기란 어려운 법. 특히 서출이자, 역적의 자식이란 굴레를 쓴 준서와의 사랑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결국 강함을 이긴다. 나는 삶을 껴안기 위해 구부러졌다”는 회한 섞인 말처럼 그녀는 사랑의 아픔조차 예술로서 승화시키고자 했다.
권지예
1960년 경주 출생. 향리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학령기에 서울에 정착. 숙명여고와 이화여대 문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국립 파리 7대학에서 7년간의 연구 끝에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단편 「꿈꾸는 마리오네뜨」로 문단에 데뷔, 귀국 후 창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기 시작했다. 「뱀장어 스튜」로 2002년 26회 이상문학상 대상, 2005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소설집 『꿈꾸는 마리오네뜨』, 『폭소』, 『꽃게무덤』, 『퍼즐』, 그림소설집 『사랑하거나 미치거나』, 『서른일곱에 별이 된 남자-반 고흐』, 장편소설 『아름다운 지옥 1, 2』, 『붉은 비단보』, 산문집 『권지예의 빠리, 빠리, 빠리』, 『해피홀릭』등이 있다.
초혼(招魂)
빛과 그림자
까치연
나, 항아(恒我)
달그림자
홍매화
초롱(草籠)
가연(佳然)
홍화(紅花)
준서(俊瑞)
동해 바다
연리목(連理木)
쌍그네
동심결(同心結)
백년가약
대관령
파종
독수공방
백정(白丁)의 칼
선물
정인(情人)
붉은 비단보(褓)
불꽃
진실
유품(遺品)
여명(黎明)
개정판을 내며
작가의 말
“신화 속에 박제된 여자,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여자”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수상작가 권지예가 그려내는
사임당의 사랑과 예술 이야기\
| 책 소개
드라마로 채워지지 않는 감동을 그리다!
새로운 화폭에 펼쳐지는 사임당의 예술혼과 불멸의 사랑
사라지고 두 구만 남은 시에서 발아한 문학적 상상력
2008년, 조선시대의 대표적 여성 예술가인 신사임당을 모티프로 예술가 소설의 한 전형을 직조해낸 권지예가 또 한 번 그녀의 이름을 호명한다. 작가는 사임당이 남긴 세 편의 시 중에서 유일하게 두 구만 남아 있는 ‘낙구(落句)’라는 시에 주목한다.
밤마다 달을 향해 비는 이 마음 (夜夜祈向月)
살아생전 한 번 뵐 수 있기를. (願得見生前)
“누구나 알고 있는 그녀의 두 수(首)의 시, 「유대관령망친정(踰大關嶺望親庭)」, 「사친(思親)」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사친시(思親詩)다. 하지만 전문이 전하지 않고 두 구만 남은 ‘낙구’라는 불완전한 시는 읽자마자 내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이 시에서 만약 그녀가 이토록 그리워하는 이가 어머니가 아니라면?” 이러한 상상의 씨앗에서 시작해 작가가 열정으로 완성시킨 『붉은 비단보』에는 사임당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우상으로서 존재하는 사임당을 온기와 숨결과 눈물을 가진 한 인간으로 그려내고 싶다는 의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졌던 터. 그러나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그녀의 이름을 되찾아주게 되었다. ‘사임당.’ 어긋난 사랑의 상처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훌륭한 어머니, 아내, 딸로서의 삶을 온전히 지켜온 사임당을 오늘의 시간으로 다시 불러낸다.
“나는 나, 내 마음의 주인은 나……”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 예술가, 사임당
“언제부턴가 예술적 자아를 가진 여성 예술가의 이야기를 쓰고 싶었다.” 폭풍 같은 열정과 광기, 그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던 여성 예술가들의 삶을 그리고자 했던 작가는 작품 안에 조선시대의 대표적 여성 예술가인 신사임당의 외면적 생의 조건들을 주요 모티프로 불러들인다. 당시에는 ‘끼’라고 치부되어 인정받지 못했던, 예술가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임당. 어린 시절, 그녀는 아들을 낳고 싶은 부모의 염원을 담아 부르던 ‘개남(開男)’이란 이름을 거부하고, 완벽한 자신의 주인이 되고자 항아(항상 恒, 나 我)라 스스로 이름 짓는다.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고운 떡고물 같은 백사장으로 흰 거품을 문 파도가 들락날락하는 것도 신기했다. (……) 갑자기 눈시울이 시큰해졌다. 꽃과 나비의 세계, 채소와 풀벌레의 세계, 그리고 글자로 이루어진 어떤 갇힌 세상에서 이렇듯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니. 아아, 세상은 어디까지일까. 내가 알고 또 내가 살면서 알아갈 세상은 어디까지일까.” (148쪽)
늘 자유를 갈망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사임당이지만,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태어나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기란 어려운 법. 특히 서출이자, 역적의 자식이란 굴레를 쓴 준서와의 사랑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러나 “부드러움이 결국 강함을 이긴다. 나는 삶을 껴안기 위해 구부러졌다”는 회한 섞인 말처럼 그녀는 사랑의 아픔조차 예술로서 승화시키고자 했다. “사내의 사랑도 부모에 대한 정도 종당엔 변화하기 마련. 우주의 모든 것은 사계절처럼 변하고, 어차피 모든 존재는 홀로인 것이다. 홀로 우주를 사는 것이다. 붓은 홀로 우주를 주유할 수 있게 하는 날렵한 한 필의 말이었다.” 이렇듯 사임당에게 있어 진정한 정인은 ‘사랑하는 사내’가 아닌 붓끝에서 피어나는 ‘예술혼’이었다.
붉은 비단보 안에 고이 감추어진
외로운 생의 그림자……
‘위대한 어머니의 표상’이라는 견고한 이미지에 줄곧 갇혀 있었던 사임당. 작가는 벽장 속 깊숙이 감춰두었던 붉은 비단보를 꺼내듯 자신의 끼와 욕망을 억누르며 슬픈 삶을 살아야 했던 그녀의 어두운 삶의 그림자를 펼쳐 보인다. “흐르는 물처럼 끊을 수 없고, 안개처럼 가둘 수 없고, 바람처럼 잡을 수 없는 허허로운 마음”들. 사임당은 세상에 미처 내놓지 못한 붉은 비단보를 바라보며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추한다. “아아, 이것이 내 마흔여덟 해 동안 내 생의 그림자로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예술혼과 차갑고 냉철한 이성의 균형을 위해 부단히 자신을 담금질해왔던 그녀였지만, 실제 삶은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내 몸을 조이는 엄나무 가시 같은 상처를 참으며” 살아왔던 것. 결국 그녀의 붉디붉은 예술혼은 수많은 상처들을 자양분으로 자라난 것이다. 작가는 ‘물속에서 쉬지 않고 발짓을 해야 하는 백조’와 같았던 사임당의 지난한 생을 통해 이렇게 묻고 있는 듯하다. 현실과 균형을 잃지 않으면서,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예술혼을 자유롭게 불태울 수 있는 예술가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
“결국 예술가란 작품으로 남는 사람이라고 단언하고 싶다. 예술가는 생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며 어떡하든 작품으로 살아남아야 한다. 어쩌면 영원한 예술가의 존재는 자신만의 ‘붉은 비단보’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므로 소설 속에서 내가 툭, 던져놓은 ‘붉은 비단보’를 열어 그녀의 생사를 확인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둔다.” (「작가의 말」 중에서)
* 책속으로 추가
재주 많고 총명하고 속도 깊은 신씨가의 둘째 딸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왔지. (……) 내 삶이 아무런 고통 없이 갈등도 없이 순하게 이어져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생에 치를 떨면서도 유능제강(柔能制剛)이란 단어를 새기면서 살아왔다. 부드러움이 결국 강함을 이긴다. 나는 삶을 껴안기 위해 구부러졌다. 엄나무 연리목처럼 구부러지고 휘었다. (392~393쪽)
불꽃은 배고픈 짐승의 혀처럼 날름날름 비단 치마를 잘도 먹었다. 머리카락이 타는 듯, 살이 타는 듯한 비단 타는 냄새가 역하게 풍겨 왔다. 그 냄새가 너무 역하다 싶을 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솟았다. 불이 붙은 치마를 끌어다 입을 막았다. 선지 같은 붉은 핏덩어리가 치마에 쏟아졌다. 각혈이었다. (402~403쪽)
타다 만 붉은 비단보의 그림은 어머니의 단심(丹心)이었다. 어머니 이전의 한 여인의 마음이었다. 그 붉은 비단보 안의 그림을 볼 때면 매창은 한없이 자유로움을 느꼈다. 비록 여인으로서 삶이 갇혀 있더라도 화폭에서는 한없이 자신의 삶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은 위안과 희망이었다. 양식에 갇히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경을 그린 것도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발견. (42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