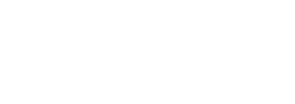김희선 소설 『라면의 황제』. 확신할 수 없는 일들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픽션들. 이 소설집이 내재한 힘은 그러한 예언의 불가능성과 잔인하리만치 현실적인 픽션의 힘에서 비롯된다. 소설이 가진 힘을 믿는 자에게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구원이 있으리. 만약 우리에게 ‘문학의 종언’이라는 테제가 유의미하다면, 이러한 단언은 다름 아닌 ‘현실-없는-현실’이라는 텅 빈 공간들, 즉 작품 속의 ‘W시’로 상징되는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의미 해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김희선
1972년 춘천에서 태어났다. 강원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 대학원 국문과를 수료했다. 2011년 『작가세계』 신인상에 단편소설 「교육의 탄생」이 당선되어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단편소설 「공의 기원」으로 2019년 제10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했다. 소설집 『라면의 황제』, 장편소설 『무한의 책』이 있다.
페르시아양탄자 흥망사
교육의 탄생
라면의 황제
2098 스페이스 오디세이
지상최대의 쇼
개들의 사생활
어느 멋진 날
경이로운 도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해설_관심의 제왕(백지은)
작가의 말
수록작품 발표지면
먹는 입, 혹은 말하는 입
지금, 라면이 왜 중요한가?
확신할 수 없는 일들과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픽션들. 이 소설집이 내재한 힘은 그러한 예언의 불가능성과 잔인하리만치 현실적인 픽션의 힘에서 비롯된다. 소설이 가진 힘을 믿는 자에게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구원이 있으리. 만약 우리에게 ‘문학의 종언’이라는 테제가 유의미하다면, 이러한 단언은 다름 아닌 ‘현실-없는-현실’이라는 텅 빈 공간들, 즉 작품 속의 ‘W시’로 상징되는 장소에서 전혀 다른 의미 해석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표제작인 「라면의 황제」는 ‘불량식품’으로 낙인찍힌 라면이 사라진 시대, 27년간 라면만 먹은 라면의 달인 김기수 씨의 책 『내 영혼의 라면 한 그릇』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촌극이다. ‘흔남/흔녀’의 일상적 사건을 고고학적으로 재조명하려는 이 소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요컨대 작품은 “그는 왜 라면만을 먹기 시작했는가?”와 같은 평범한 물음으로 다가서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가 왜 라면만을 먹지 않을 수 없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이면에 간직하고 있다. 더불어 「지상 최대의 쇼」와 「경이로운 도시」에서 외계인은 지구를 ‘방문’한다. 지구인은 이 외계 생명체의 방문에 꽤 관대한 편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거리와 먹을거리를 뺏기지 않으려는, 결국 이 사회체계 안에서 살아남으려는 인정투쟁의 장이 오히려 확대된다는 사실이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라면을 마저 먹었다. 외계인들이 지금 당장 떼 지어 내려온다 해도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기도 했다. 9급 소방공무원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지상 최대의 쇼」, 162쪽)
처음에, 도시 외곽의 버려진 폐교를 깨끗이 수리한 뒤 페인트칠까지 새로 하여 그들을 거주하게 해준 대가로 W시가 외계 난민들에게 요구한 건, 아주 약간의 노동력뿐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태생이 게으른 데다 평소 불평불만이 몸에 배어있던 그 가난뱅이 외계인들은,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툭하면 근무지를 빠져나가 산속으로 도망치길 거듭했다는 것이다.(「경이로운 도시」, 267쪽)
우리가 알던 외계인의 ‘위용’은 온데간데없고, 여기에는 온전히 ‘삶-투쟁’으로서의 전 지구적 현실만이 반영되어 있다. 실상 미스터리한 건, 외계인의 정체성이나 그들과의 문명적 대화보가 아니라 철저한 ‘먹고사니즘(먹고사는 문제가 ’지상 최대의 쇼’가 되는 일)’인 것처럼 보인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가? 즉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입이 먹는 입을 이길 수 있는가? 작가가 던지는 이 물음에 대답하는 것, 다시 말해 외계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내재한 문제틀이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혹자가 이 소설집을 두고, “지금, 왜 라면이 중요한가?”라고 묻는다면, “지금, 라면이 중요하지 않을 이유라도 있는가?”라고 되받아쳐야 할 이유는 충분한 셈이다.
근-미래로서의 현재,
어쨌든 우리는 안녕할까요?
도래할 것으로 남아 있는 것들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들 사이의 시차. 우리는 지금, W시를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의 시민이다. 그리고 동시에 W시가 부여하는 삶의 방식을 교육받아 온 한 명의 주체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은, 저마다의 정체성을 탐닉(당)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미-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사물처럼 기능한다. 그리고 이 기능성은 근-미래로서의 현재, 즉 (곧,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현재 속에 기입된 미래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데 1968년 12월 5일도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일지도 모른다. 그날,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길고 기이한 글이 한국에서 반포되었기 때문이다. 모든 학생은 반드시 그 헌장을 외워야 했다. 마치 마녀사냥을 피하려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워야 했던 오래전의 어느 시대처럼, 1968년 한국의 학교에선 국민교육헌장을 외우게 했다. 그리고 최두식은 나사에서의 미적분 계산을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교육의 탄생」, 65쪽)
이 같은 반복의 장면을 우리는 수없이 목도한 바 있다. 어린 시절 끝없이 되뇌던 국민교육헌장처럼, 비극의 아우라는 여전한 모습으로 현재를 잠식하는 것이다. 이 작품이 SF라는 장르 속에서 팩션이라는 속성을 어렴풋이 비치는 것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우연이라는 필연, 즉 우연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관심을 두고 지켜보면 곧 필연으로 밝혀질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페르시아 양탄자 흥망사」의 ‘김선호 옹’,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의 ‘김홍석 씨’, 「어느 멋진 날」의 ‘아부엘’은 이렇듯 저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인물들이다. 이 인물들의 과거와 현재를 약간만 파고 들어가는 것, 이들에게 약간의 관심을 나눠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재의 씨줄과 날줄을 새롭게 엮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기시감, 후에 언제고 보았던 것처럼 느껴질, 지금-여기의 우연적 비극들을.
“좀 더 찾아보는 게 어떨까. 아직 뭔가 남아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야.”(「2098 스페이스 오디세이」, 132쪽)
어쨌든, 작가를 따르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지구별을 조금 더 탐사해보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바로 그 미지의 장소에, 곧 닥쳐올 우리의 미래를 위한 뭔가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미래의 우리는 과연 ‘안녕’할까? 모를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안녕이 외계인의 손에 달려 있진 않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