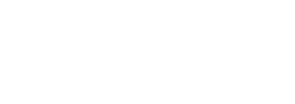해이수의 장편소설 『눈의 경전』. 지나온 길과 지나갈 길이 겹쳐지고 엇갈리는 히말라야. 저곳의 동경과 이곳의 비애를 간직한 혹한의 눈보라 속에서 만난 순도 높은 생의 한 순간을 그린 작품이다.
해이수
저자 : 해이수
저자 해이수는 1973년 수원에서 태어나 2000년 『현대문학』 중편 부문으로 등단했다. 소설집 『캥거루가 있는 사막』과 『젤리피쉬』, 장편소설 『십번기』가 있다. 심훈문학상과 한무숙문학상을 수상했다.
길게 휘어진 시간
구원자
쑨달라
스테인드글라스
폭설
시드는 꽃
불꽃놀이
고산병 함정
만다린
봄 그리고 봄
놓칠 수 없는 기회
텅 빈 흰 몸
라스트 카니발
우주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처음부터 다시 걸어오라
작가의 말
사랑을 기억하는 공간, 히말라야에서
눈송이로 묘사된 인연
수연과 결혼해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던 완은 뜻밖에 소식을 듣는다. 유학 시절에 만났던 사랑, 유밍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다는 것. 완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다. 완은 사랑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자 떠난다. 완이 여행을 시작하며 유밍과의 찬란하면서도 뜨거웠던 사랑이 상기되고 히말라야라는 ‘공간’은 새롭게 다가온다. 완의 발걸음이 닿는 공간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다. 그곳은 사랑이 깃들어 있는 공간이자 수많은 인연을 만나는 우주다.
완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었던 공간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했을 때, 현실은 또 다른 산으로 다가왔다. 이곳의 히말라야에 유밍이 있었다면, 현실의 산에서는 수연이 기다리고 있다. 완은 이곳의 히말라야에서 내려가고자 한다.
지나왔던 길을 처음부터 되짚어갈 시간이었다. 완은 멀리 겹을 이룬 설산과 푸르게 밝아오는 하늘과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았다. 마치 20일간의 깊은 꿈에서 깨어난 듯 눈앞의 공기는 맑고 시렸다. 자신을 품어준 숭고한 산, 자신을 다독여 한계를 인정하게 만든 이곳의 마지막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을 감았다.
쿰부 히말라야에서 맞이한 눈보라 속의 수억만 송이의 눈꽃은 자신의 삶을 이룬 수많은 인연과 대비된다. 작품 속 주인공 완 역시 자신을 한 점의 눈송이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기억을, 사랑을, 유밍을 그곳에 둔다. 그는 추억한 유밍이나 여행을 통해 만났던 인연이 그렇듯 자신 역시 한 점의 눈송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서로 부딪치며 파동을 일으키고 솟구치고 때로는 일렁이며 뒤섞이고 회오리치는 눈꽃. 우리의 생과 우리가 맺은 인연 역시 흩날리는 눈꽃이 아닐까. 작가 해이수가 추구한 휴머니즘을 눈꽃으로 표현한 작품 『눈의 경전』이다.
▶ ‘작가의 말’ 중에서
― 나는 울고 싶지만 신은 내게 쓰라고 명하네.
바슬라프 니진스키의 고백도 곧잘 웅얼거렸다. 글씨를 쓰는 일보다 더 많이 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한 일이다. 욕망에 시달리는 내가 보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내가 보였다. 자판에서 손을 떼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상하게 숙연해졌다. 퇴고를 할 때는 한 손으로 염주를 굴렸다.
― 왜 몰랐을까? 관계가 상처를 먹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몇 해 전, 쿰부 히말라야의 대폭설 기간에 나는 그곳을 걸었다. 산을 둥글게 감고 이어진 그 나선의 길은 실상 바람과 눈보라의 길이었다. 걷는 중에 수평의 도시인 시드니와 수직의 공간인 서울이 떠올랐다. 지나온 길과 지나갈 길이 서로 맞닿으며 비틀거리는 그곳에서 두 장소의 기억은 중첩되거나 엇갈리고 분산되거나 일그러지며 내 안으로 말려들었다.
― 두 손이 모아지는 지점에 바로 가슴이 있다는 것.
장편의 아우트라인은 부악문원에서, 머리는 토지문화관에서, 몸통은 미국 아이오와 레지던시에서, 정신적 환기는 중국의 서안과 하문에서, 꼬리는 군포 중앙도서관 창작실에서 이루어졌다. 활력을 불어넣어준 한국문학번역원에 감사하고, 퇴고 공간 마련을 도와준 상연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심진경 평론가는 글의 부족한 점을 짚어주었고 박상우 선배는 때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주었다. 매화를 선물로 주신 구본창 사진작가와 제목의 영감을 주신 김수복 시인 앞에 두 손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