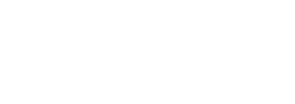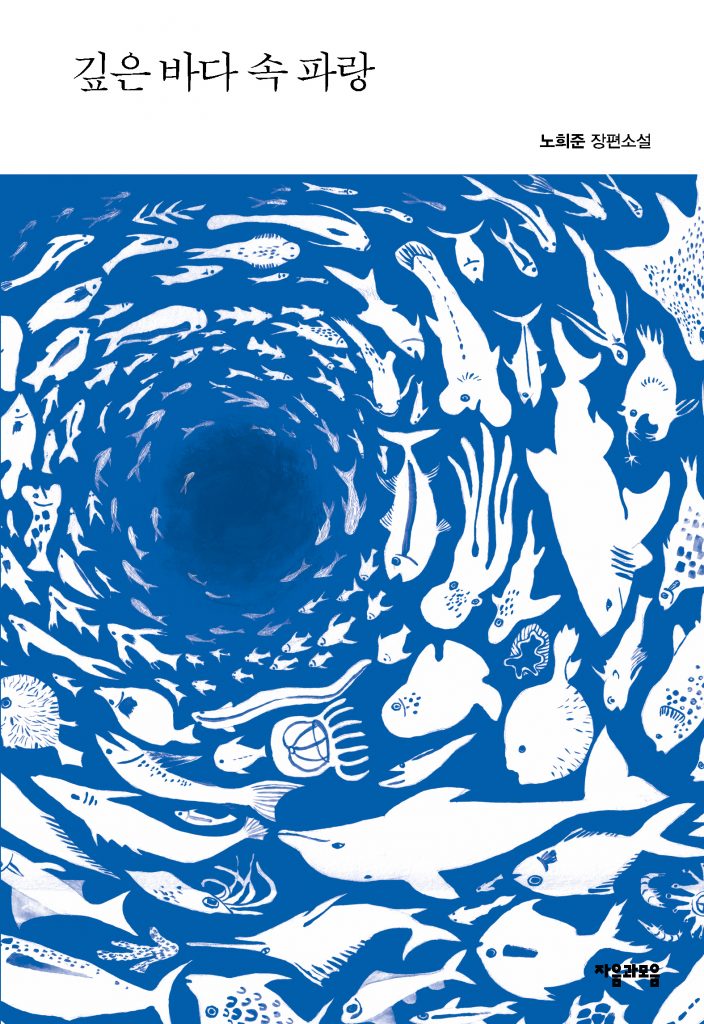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문학의 외연을 넓히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노희준의 네 번째 장편소설. 『오렌지 리퍼블릭』에서는 강남에서 부모 세대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를 바탕으로 향락적 소비문화를 즐기던 오렌지족의 은밀한 삶을, 『넘버』에서는 기억을 이식당한 채 시체 청소부가 된 남자와 타인의 기억을 조종하는 살인 호스트가 된 남자가 진짜 범인을 놓고 벌이는 대결을 흥미롭게 그려낸 그의 상상력이 이번엔 심해의 깊은 어둠 속을 향한다. 작가는 인류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심해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절망과 희망이라는 경계선 위에 세워놓는다. 구세계의 마지막 날, 인류 앞에 나타날 단 하나의 희망은 무엇일까?
노희준
저자 : 노희준
저자 2005년부터 책을 내기 시작하여 두 권의 단편집과 네 권의 장편을 냈습니다. 어릴 때는 노래를 했고, 청소년기에는 미술을 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은 글쓰기뿐인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장르의 경계를 넘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예술가들의 어깨동무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기를 꿈꿉니다. 예술가들의 좌충우돌 창업기를 다룬 다섯 번째 장편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문학과 음악과 미술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체험할 수 있는 예술캠프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 속 파랑
작가의 말
슬픔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깊은 바닷속에,
눈부시게 일렁이는 빛의 파문
거대한 핵폭발에서 살아남은 잠수함 파랑함. 그곳에 어쩌면 세상에 남은 마지막 인류일지도 모를 세 남녀가 타고 있다. 피셔, 셀린, 이삭. 그들은 서로를 테러리스트 조직이자 이 핵폭발의 원인일지도 모를 ‘앨리스’의 일원으로 오해하면서도, 심해 속에 체류하기 위해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피셔는 심해로 떨어지는 작은 유기물 알갱이를 먹고 스스로 빛을 내는, 이제껏 단 한 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은 심해어 루시의 안위를 걱정한다.
신이 선택한 노아의 방주처럼, 신이 예비한 퍼즐 조각처럼 파랑함 속에 살아남은 그들은 귀환할 곳이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리고 자신들의 남은 생을 파랑함 속에서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그러나 피셔는 ‘잠수함에 남은 세 명이 현재 지구에서 가장 건강한 인류’이며, ‘루시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생물종’이라고 판단하고 인류에 대한 기록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생존을 결심한다.
“셀린과 이삭은 잠수함 안에서 눈을 감아야 하겠지만 두 사람의 자손은 육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들의 자손은 예전과 다를 바 없는 지구에서, 아니 그보다 훨씬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아가게 되리라. 결국 지구의 자연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셈이었다.”
끝이 없는 기록,
생명의 기억이 있는 곳에서라면 언제든
다시 시작될 미완성의 이야기
피셔, 셀린, 이삭은 인류의 미래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파랑함 안에 수조를 만들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해양 생물들을 길러내는 데 성공한다. 이로써 그들은 지속 가능한 공기와 물 그리고 식량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피셔는 인류라는 방대한 책을 계속 써나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임무는 젊은 남녀인 셀린과 이삭의 몫이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가 어떤 결말로 끝을 맺을지는 파랑함 안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다.
“구세계의 마지막 날, 세 사람은 조종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레이더는 소형 잠수함 크기의 미확인물체가 접근 중임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다. (……) 세 사람은 그저 서로의 손을 잡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기만 했다. 그것은 심해에 펼쳐진 우주였다. 수천 개의 별이, 어둠 속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다. 아무리 바라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이상한 별들이었다.”
『깊은 바다 속 파랑』은 단순히 어느 미래에 일어날지 모를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다. 파랑함을 감싸고 있는 심해의 짙은 어둠은 ‘지금-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어둠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 끝에 다다랐을 때 또 다른 시작이 예고돼 있으리라 희망할 뿐이다. 위기가 닥칠 때만 번식하는 신비의 물고기 ‘루시’처럼, 삶의 끝과 시작이 맞닿는 경계에서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의 ‘루시’와 만나게 될 것이다.
‘작가의 말’ 중에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말을 썼다는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5개월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나이 든 남자의 편을 들고 있었다. 피셔로 하여금 아버지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하고 있었다. (……)
작년 겨울 강원도에 처박혀 소설의 절반가량을 다시 썼다. 아마도 아버지의 영혼이, 아니 내 무의식 속의 아버지가 의도했을 문장들을 지우며 나는 뭐랄까, 슬프다기보다는 아팠다. 심장을 수제비 반죽마냥 떼내어 한 조각씩, 뜨거운 물속에 던져 넣고 있는 기분이었다. 수십 개로 찢어진 채 끓고 있는 심장을 느끼며 새로운 마무리를 짓고 나자, 그 안에는 내가 그토록 거부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오해했던 아버지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