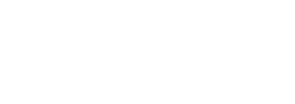실재와 허구, 현실과 비현실
그 경계를 뒤흔드는 미스터리 심리 환상극
현진건문학상, 혼불문학상 수상 작가 권정현 신작 장편소설
현진건문학상과 혼불문학상을 수상하며 날카로운 상상력과 생생한 묘사로 흡입력 넘치는 작품 세계를 펼쳐온 권정현 작가가 세 번째 장편소설을 펴냈다. 새소설 시리즈의 아홉 번째 작품인 『검은 모자를 쓴 여자』는 기묘한 사고로 아이를 잃은 여자의 혼란을 통해 상실감에서 기인한 불안을 집요하게 조명한다.
이 소설은 에드거 앨런 포 『검은 고양이』의 고딕 호러와 아멜리 노통브 『머큐리』와 같은 심리 미스터리 장르를 교묘히 결합해 개인에게 일어나는 공포와 불안의 심리를 현실적인 긴장감이 넘치게 선보인다. 주인공 주변에서 크고 작은 미심쩍고 기이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그 사고의 원인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그녀를 사로잡으며 이야기는 펼쳐진다.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무엇이 허구인지 끝없이 의심케 하는 밀도 있는 전개는 읽는 이를 점점 더 작품 속 세계로 끌고 들어간다.
진실과 거짓이 빈틈없이 얽혀 경계가 사라지고 ‘내가 인식하는 세상’만이 오로지 진실이 되는 공간. 그곳에서 작가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나눌 수 없는 내면의 혼돈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드러내며 인간의 고통과 불행이 외부와 내부, 그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우리에게 질문케 한다.
검은 모자
송장나비
무지와 까망
도깨비풀
헌옷수거함
여행
용왕보살
차계부
아하스 페르츠
벽 안의 대화
우로보로스
마술사
요석교회
데칼코마니
그리고 나비
작가의 말
“나는 모든 밤과 모든 시간 속의 너를 기억해”
악몽처럼 시작된 의심의 미로
『검은 모자를 쓴 여자』는 현실에 대한 불온한 의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다. 이 작품은 주변인, 가족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이르기까지,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계를 점진적으로, 그러나 동시에 파격적인 방식으로 보여준다.
사고로 아이를 잃은 주인공 ‘민’. 그녀는 그 고통을 이겨내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믿지만 상처에서 촉발된 불안은 마치 그림자처럼 계속해 민을 따라다닌다. 그 형태는 때로는 검은 모자를 쓴 여자로, 때로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타난다. 그러던 중 민은 입양한 아이 동수와 함께 데려온 검은 고양이가 원래 키우던 개를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사건을 겪으며 자신이 다시 쌓아올렸다 믿은 평화의 얄팍함을 깨닫는다.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 고양이도 동수도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부 사이에 끼어 들어온 타자였다. 상처를 덮기 위해 급조된 환경이었다. 지금의 평화는 봄이면 무너진 축대 위에 흐드러지게 피어나곤 하는 개나리처럼 어딘지 위태로워 보였다. 축대가 무너지는 순간 노란 꽃들은 언제든 비명을 지르며 뭉개질 것이다. (70쪽)
행복의 연약한 외피가 깨졌을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소설은 화자인 ‘민’의 의식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우리는 그녀의 심증에서 나오는 의심을 합리적인 추론처럼 듣게 되지만 실은 무엇이 진실인지 그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불행의 시점마다 반복해 듣는 말이 있다. “그냥 사고였을 뿐이야…….”(44쪽)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단순한 사고라는 위로. 그녀가 단 하나 확신하는 것은 그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침내 남편의 차에서 의심스러운 고백이 담긴 일기를 발견하면서 이야기는 점점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닫는다.
아이의 죽음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지, 검은 고양이는 정말로 불길한 악마의 전령일지, 동수의 엄마는 실재하는지. 환상과 현실이 서로 꼬리를 물듯 뒤엉켜 있는 세계 속에서 그녀가 의심하던 것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까.
“(……) 나는 모든 밤과 모든 시간 속의 너를 기억해. 왜 그랬어, 도대체 왜?”
“고통을 주고 싶었거든, 서서히. 피가 마르도록.”(227쪽)
‘모든 밤과 모든 시간’ 동안 그녀가 기억하는 것은 과연 누구이며, 그 존재는 그녀에게 왜 고통을 주고 싶은 것일까.
작품은 불안을 겪는 인물의 내면 심리와 행동 양상을 밀도 있게 조명함과 동시에 미스터리적 요소를 곳곳에 촘촘히 배치해 페이지를 넘길수록 빠져드는 흡입력을 가졌다. 그로 인해 독자에게 미스터리라는 이름의 늪을 헤매는, 그리고 헤맬수록 더 그 늪에 가라앉는 듯한 강렬한 경험을 선사한다. 또한 소설은 전반에 걸쳐, 자신이 믿어온 견고한 행복이 밀물의 모래성처럼 고요히 무너져 내리고, 다시는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간이 드러내고야 마는 날것의 내밀한 광기가 대담하게 흩뿌려져 있다. 작가는 그를 통해 묻고 있는지도 모른다. 일상의 당연한 행복이 부서진다면, 당신의 내면에는 과연 무엇이 존재하는지.
■■■ 작가의 말
이 소설은 처음과 끝이, 왼쪽과 오른쪽이, 위와 아래가, 과거와 현재가 구분되지 않고 동그라미 안에 뒤섞여 있다. 우리는 여전히 제 꼬리의 기원을 찾아, 제 꼬리를 물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진실과 정의, 시대와 역사, 슬픔과 기쁨, 잠깐 스치는 인연들, 나아가 우리 삶이 이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