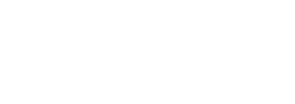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
찾도록 운명 지어진 자가 아들이다.”
프랑스 문단과 언론의 찬사를 받은 작가
이승우가 천착하는 ‘아버지’라는 존재
노벨상 수상자 르 클레지오가 ‘한국의 노벨상 기대주’라고 극찬했으며, 최근 죽은 형과 동생을 착각하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작가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기독교적 세계관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소설 「마음의 부력」으로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이승우 작가의 장편소설 『한낮의 시선』이 독자들과 다시 만난다.
『한낮의 시선』은 아버지를 찾는 아들과 그 아들을 부정하고 뿌리치는 아버지, 그 불편한 관계의 심층을 재조명하며 도대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묻고 있는 형이상학적 소설이다. 하지만 소설 속 아버지는 비단 생물학적 아버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억압”하는 존재이며, 작품의 제목인 ‘한낮의 시선’처럼 피할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내면 속의 억압과 권위의 상징으로 그려지고 있다. “어떤 존재를 의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하려 해도 피해지지 않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 쓰고 싶었다”는 이승우 작가의 말처럼 작품 속에서 “아버지는 국가, 조직, 종교 등 세상의 모든 권위를 상징”한다.
한낮의 시선
작가의 말
“어떤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야말로 그런 존재지.
죽기 전에는 없어질 수 없다는 뜻이야.
어떤 경우에는 죽어서도, 죽은 채로 있는 게 아버지지.”
도대체 죽어서도 존재하는 아버지란 누구인가.
‘아버지’라는 진정한 존재를 찾기 위한
근원적 탐색에 관한 기록
이 소설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 첫 문장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 도시로 모여든다. 하지만 내게는 도리어 죽기 위해 모인다는 생각이 든다.”(7쪽) 대학원생인 주인공(한명재)은 아버지 없이 성장하지만, 어머니라는 완벽한 울타리로 인해 결핍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던 중 결핵에 걸려 어느 소도시로 요양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노교수를 만난다.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있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지. (……) 더구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부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야말로 그런 존재지.”(33~34쪽) 노교수와의 대화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게 된 주인공은 결국 나바호족의 쌍둥이처럼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찾아온 이들, 무너져 내리는 바위산과 사람을 토막 내는 갈대숲과 선인장밭과 끓는 사막을 통과해 온 이들은 아버지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그는 두 청년을 집어 들더니 동쪽에 있는 흰 조개로 만든 뾰족한 창에다 던져버렸다. (175~176쪽)
그러나 쌍둥이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은 비정한 아버지 태양처럼 주인공의 아버지는 자신을 찾아온 아들의 사랑을 거부하고, 아들이라는 존재를 뿌리친다. 지역 단체장 선거 후보로 출마한 아버지를 유세장에서 마주한 주인공은 자신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지만 차갑게 외면받는다.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부정당한 주인공은 “‘사랑하다’가 아들에게 속한 동사가 아님을” 깨닫고,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찾는 자, 찾도록 운명 지어진 자”(178쪽)가 아들이라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추구하는 존재거든. 때로는 자기가 무얼 찾는지, 왜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찾고 추구하지. 몽유병 환자처럼 말이야. 찾다가 못 찾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추구가 의미 없는 건 아니지.” (56쪽)
“아들들은 그저 아버지일 뿐인 존재를 찾을 뿐”이며 “사랑의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추구하는 자”(177~178쪽)라는 내면적 깨달음을 통해 주인공은 “그를 둘러싼 모든 풍요를 도리어 끔찍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단 하나의 결핍”(207쪽)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한낮은 숨을 수 없는 시간이다. 시선은 타인을 의식하는 자의 언어이다. 타인에게 붙들린 자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작가의 말처럼 『한낮의 시선』은 지상의 모든 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낸다.
“언제나 그렇듯 뿌듯하고 아쉽다. 그렇지만 모퉁이를 돌면 부딪칠 것 같은 알 수 없는 존재, 부딪치기를 바라는지 바라지 않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초월이며 내재인, 미지의 큰 시선과 웬만큼 친해진 것 같긴 하다. 다행이다.”
– 저자의 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