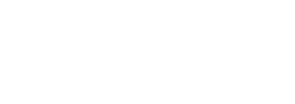성장이란 단어보다 생존이란 단어에 익숙해진
지금 십대들의 ‘일주일’의 표정
한국문학의 새로운 작가들을 시차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획 [자음과모음 트리플 시리즈]의 여덟 번째 작품으로 최진영 작가의 『일주일』이 출간되었다.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된다. 성당 유치원에서 만난 ‘나’와 ‘도우’와 ‘민주’는 신앙심 대신 셋이 함께하는 고유한 의식을 치르며 모든 ‘일요일’들을 공유한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나’는 특성화고에, ‘도우’는 특목고에, ‘민주’는 일반계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조건 없이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던 ‘일요일’의 풍경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두 친구(도우와 민주)와는 달리 현장 실습생이 되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냉혹한 사회로 나오게 된 ‘나’는 “우리의 노력이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다른 일요일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일요일」, 49쪽)는다.
이 책의 마지막에는 작품 해설 대신 십대 청소년의 글이 실렸다. “당신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라는 작가의 부름에 가장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응답을 해주었다. 서로 조금 떨어져 앉은 채 비슷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십대들의 모든 ‘일주일’의 표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에세이 사사롭고 지극한 안부를 전해요
발문 지금 도망칠 준비가 되면-박정연
“좁은 방을 맴도는 걸 멈추고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우리 조금만 더 친해지자고.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자음과모음 트리플 시리즈]는 한국문학의 새로운 작가들을 시차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획이다. 그 여덟 번째 작품으로 최진영 작가의 『일주일』이 출간되었다. 『팽이』 『겨울방학』 『이제야 언니에게』 등의 작품을 통해 “청년 세대의 고뇌를 진솔한 언어로 그려내며 폭넓은 공감대를 획득”(신동엽문학상 심사평)해온 최진영 작가가 이번에는 성장이란 단어보다 생존이란 단어에 익숙해진 십대 청소년들의 ‘일주일’의 표정을 담아냈다. “당신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당신이 거기 잘 있으면 좋겠어”라는 ‘작가의 말’처럼 『일주일』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정한 위로를 건넨다.
“「일요일」의 표정과 「수요일」의 표정과
「금요일」의 표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불완전한 시간에 보내는 사사롭고 지극한 안부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된다. 성당 유치원에서 만난 ‘나’와 ‘도우’와 ‘민주’는 신앙심 대신 셋이 함께하는 고유한 의식을 치르며 모든 ‘일요일’들을 공유한다. 하지만 성장을 하면서 ‘나’는 특성화고에, ‘도우’는 특목고에, ‘민주’는 일반계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조건 없이 서로의 평화를 빌어주던 ‘일요일’의 풍경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두 친구(도우와 민주)와는 달리 현장 실습생이 되어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냉혹한 사회로 나오게 된 ‘나’는 “우리의 노력이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 다른 일요일을 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일요일」, 49쪽)는다.
친숙한 단어들이 무섭게 다가왔다. 거리낌 없이 듣고 말하던 단어를 모아서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완성한 것만 같았다. 사망 보도를 본 뒤 틈날 때마다 인터넷으로 관련 기사를 찾아봤다. 표준협약서에는 현장 실습생의 최대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사고가 난 기계는 이전에도 여러 번 고장이 났던 기계였다.(「일요일」, 35쪽)
“무관심하지 않고 열렬히,
포기하는 대신 포기하지 않고.”
완성하고 번복하고 다시 완성할 ‘십대’라는 시간
「수요일」에는 암호 같은 비밀문자―세 번의 호환을 거쳐야 알 수 있는, 오직 ‘지형’만이 알 수 있는―만을 남겨놓은 채 가출을 한 ‘지형’과 그의 엄마―‘지형’이 엄마가 아닌 보호자라고 부르는―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나’의 이야기가 그려져 있다. 지형의 엄마는 오뚝이의 원리를 설명하며 “다시 일어서지 않는 오뚝이는 고물이다. 고물은 쓰레기”라며 절대로 쓰러지지도 굴러가지도 않는 위에 있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바람대로 ‘지형’이 실패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형’ 역시 언제든 중심을 읽고 쓰러질 수 있음을, 그리고 ‘지형’이 남겨놓은 비밀문자에 담긴 내용은 “복잡하지도 거창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호자는 숄더백으로 내 팔을 계속 후려쳤다.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 중심을 잃고 그냥 픽 쓰러지고 싶었다. 쓰러져도 고물은 아닌 존재로 살고 싶었다. 하지만 서영광 같은 어른들은 내가 쓰러져도 쓰러졌는지 모를 거다. 쓰러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고물이었다고 생각할 거다. (「수요일」, 86쪽)
「금요일」은 누구한테도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자퇴를 결심하는 ‘나’의 이야기다. “후회할 수도 있는 거고, 후회는 잘못이 아니”니까 ‘나’의 선택을 “가능한 넓게 길게 아주 멀리까지”(「금요일」, 128쪽)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순간에도 “무관심하지 않고 열렬히, 포기하는 대신 포기하지 않”(작가 에세이, 「사사롭고 지극한 안부를 전해요」, 144쪽)기 위해서.
이 책의 마지막에는 작품 해설 대신 십대 청소년의 글이 실렸다. “당신과 조금 더 친해지고 싶어.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라는 작가의 부름에 가장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응답을 해주었다. 서로 조금 떨어져 앉은 채 비슷한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의 소설과 에세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 십대들의 모든 ‘일주일’의 표정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울퉁불퉁한 모래사장 위의 감각에 익숙해질 때쯤, 재생시켜놓은 노래 뒤로 묻을 수 없는 걱정과 고민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죽지도 않고 기어 나왔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 대체 뭘 해 먹고살아야 하는 걸까.”(박정연, 「지금 도망칠 준비가 되면」, 152쪽)
작가의 말
글을 쓰는 동안 오직 소설 속 인물만을 생각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그런 시간을 보낸 뒤에는 나란 인간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다. 이번에도 달라지고 싶었다. 좁은 방을 맴도는 걸 멈추고 다시 의자에 앉으며 인물에게 말을 걸었다. 우리 조금만 더 친해지자고.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발문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런 도망은 언제나 환영이다. 짧은 생에 다 품기엔 무겁다 싶을 때마다 넓게 보고 많이 사랑할 것이다. 쫓기는 삶이 안정될 때까지, 가끔은 도망치면서 살길. 이 결심에 죄책감은 느끼지 않기로 했다. ―박정연, 「지금 도망칠 준비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