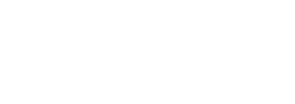단단하지만 섬세한,
담담하지만 강렬한 여운을 주는 여덟 편의 단편들
삶의 수많은 불가능들 앞에서 느끼게 되는 절망이나, 얼핏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근원적 불안들을 예민하게 감각해온 신인작가 김연희의 첫번째 소설집. 2009년 대산창작기금을 수혜하며 등단한 김연희는 “기성작가들의 익숙한 상상력과 구별되는 다소 엉뚱하면서도 비약적인 상상력은 동어반복의 서사에 지친 독자들에게 반가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책에서 작가는 ‘+’와 ‘and’ 같은 검색 연산자를 통해 이해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을 검색하는 작품 속 인물처럼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세계”에 대한 탐색을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작품 속에 호명된 이야기들은 우리 각자의 추억들과 공명하면서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너의 봄은 맛있니
트란실바니아에서 온 사람
〔+김마리 and 도시〕
사과
아 유 오케이?
블루 테일
카프카 신드롬
서천꽃밭 꽃들에게
해설 | 재현된 여성과 여성적 실감 사이_박진
작가의 말
현실의 수많은 불가능들 앞에서,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
이 책에 실린 여덟 편의 단편들은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의 수많은 불가능을 보여주고 있다. 임신한 뒤로 사과만 먹어대던 여자가 일부러 발육을 억제한 과수 재배용 사과나무를 보고서는 충격을 받는다는 내용의 「사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혼녀의 삶을 모두가 백안시하고 불길해하는 ‘흡혈귀’와 엮어놓은 「트란실바니아에서 온 사람」, 주말마다 예식장을 돌며 훔친 축의금으로 명품을 쇼핑하는 여자가 등장하는 「아 유 오케이?」, 쌍둥이 엄마의 정신없는 일상과 그 속에 잠복된 또 다른 욕망을 그린 「블루 테일」 등. 작품에서 재현되고 있는 현실들은 섬뜩함과 불안, 불길함과 기괴함 등을 서사화하는 작가의 정교한 언어적 감각으로 인해 보다 증폭되어 우리에게 전해진다.
불현듯 여자의 머릿속에 엉뚱한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아이가 (Q)에게 목이 물렸나. 그러면 나도 물어달라고 해야 하나. 우리 모자는 이렇게 흡혈귀가 되는 건가. 여자는 흡혈귀로 변해서 개의 피를 마시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렇게라도 오래오래 살아서 욕심 많은 자의 인생을 지켜보고 싶었다. 인생에는 반드시 벼랑 같은 끝이 있었다. 여자는 욕심 많은 자들의 끝을 구경하고 싶었다. (「트란실바니아에서 온 사람」, 53~54쪽)
‘그럼에도 지속되는 삶’
그 아픈 시간들에 건네는 따뜻한 위로 같은 소설
그러나 이 작품들이 단순히 강렬함만으로 일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불가능들 사이에 자연스레 형성되는 안쓰러움과 연민의 감정들이 소설의 체온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표제작인 「너의 봄은 맛있니」에선 따뜻하고 다정한 정서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CD플레이어와 MP3, 노트북 컴퓨터와 로터리식 TV”가 우리 모두의 젊은 날을 환기시키고 있다는 점도 그렇고, 아직은 미숙하고 불안하지만 ‘나’와 ‘여경’이 스스로의 삶을 모색해가는 모습에 조심스러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도현이 뒤집어 들고 흔든 파인애플 상자에서 떨어진 박하사탕 유리병은 어떻게 되었을까. 멀쩡할까? 깨졌을까? 나는 유리병이 깨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새하얀 박하사탕이 눈 녹은 길바닥에 흩어져 더럽혀지고 부서지기를 원했다. 갑자기 혀에서 독초가 움트는 것처럼 쓰고 떫은맛이 번졌다. 어쩌면 이게 봄의 맛인지도 몰랐다. 나는 그 쓰디쓴 맛을 기꺼이 삼키며 여경의 고모네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너의 봄은 맛있니」, 29쪽)
“앞으로는 그들의 선인장을 섬세하고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 먼저 이 책을 집어 든 당신부터 두 팔로 힘껏 안아주고 싶다. 그 순간 선인장의 날카로운 가시가 조금이나마 무뎌지길.” 이러한 작가의 말처럼 “독초가 움트는 것처럼 쓰고 떫은” 이별의 아픔을 뒤로한 채 이별에 상심한 ‘여경’을 위로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나’에게 작가는 마음으로 응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국 작가는 현실의 수많은 불가능들 앞에 좌절하면서도, ‘그럼에도’ 삶을 지속해나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이다. 김연희의 소설이 유독 따뜻하게 기억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