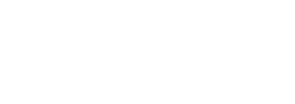누구에게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2005년 <흙 속의 아이>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한 나카무라 후미노리의 장편소설『모든 게 다 우울한 밤에』.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호까지 국내 계간 문예잡지「자음과모음」과, 일본 월간 문예잡지「스바루」11월호에 동시 연재된 작품이다.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고아 출신의 주인공 ‘나’는 자신이 바닷가에서 어떤 여자를 살해한 듯한 모호한 기억 때문에 악몽에 시달린다. ‘나’에게는 고교 시절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마시타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정신병 증세를 보이다 결국 자살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의 고백이 담긴 노트를 ‘나’에게 남긴다. 그 노트를 읽은 후 어쩐지 마시타가 된 것처럼 혼란스러워진 ‘나’는 돌발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나’는 이제 그럭저럭 좋은 이미지의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 신혼부부를 살해한 열여덟 살 소년 야마이가 입소한다. 야마이를 보호 감찰하는 직무를 맡은 ‘나’는 그에게 묘한 동정심과 동질감을 느끼며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 그가 자살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나’는 그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나카무라 후미노리
1977년에 태어났고, 후쿠시마 대학 행정사회학부를 졸업했다. 2002년 『총(銃)』으로 신초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으며 같은 작품으로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올랐다. 2003년 『차광』으로 다시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올랐으며 2004년 노마 문예 신인상을 수상했다. 2005년 『악의의 수기』로 미시마 유키오 상 후보에 올랐고, 같은 해 『흙 속의 아이』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했다. 2010년에는 『쓰리』로 오에 겐자부로 상을 수상했다. 2012년 『쓰리』는 미국에서 『The Thief』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고, 『월 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의 ‘The Best Fiction of 2012’로 선정되었다. 2014년에는 미국의 David L. Goodis 상을 수상했다. 한국에서 출간된 작품으로는 『흙 속의 아이』 『모든 게 다 우울한 밤에』 『쓰리』 『악과 가면의 룰』 『왕국』이 있다.
서장
1부
2부
3부
작가의 말
작품 해설
2008년 겨울부터 2009년 봄호까지 계간 문예잡지『자음과모음』과 일본 월간 문예잡지『스바루(すばる)』11월 호에 동시 연재된 장편소설『모든 게 다 우울한 밤에』가 단행본으로 출간된다. 외국 작가의 작품이 국내 문예지와 본국 문예지에 거의 동시 연재되는 점, 비슷한 시기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출판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여겨진다.
『모든 게 다 우울한 밤에』의 저자인 나카무라 후미노리는 2005년『흙 속의 아이』로 아쿠타가와 상을 수상하며 국내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인간 본성에 대한 고전적인 주제에 관심이 많다. 2002년 소설 『총』으로 신초 신인상, 2004년『차광』으로 노마문예상을 받았다. 두 소설 모두 아쿠타가와 상 후보에 올랐다.
<아쿠타가와 상> 수상 작가 나카무라 후미노리 신작
열여덟 살에 살인을 저지른 그에게도 살아야 할 이유는 있다!
눈물 나게 아름다운 세상을 알려주는 교도관이 있기에…….
● 줄거리
죽음이 흔하고 쉬운 시대, 붕괴되는 인간의 정신
죽어 있는 여자의 다리를 잡고 있는 어린 나, 그리고 그 옆에서 불안한 시선을 하고 서 있는 한 남자. 어린 시절 꾸었던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기억, 실제라고 하기에는 그 나이에 바닷가에 간 일은 없다고 말하는 양부모. 서른이 넘어서까지 나(주인공)를 괴롭히는 이 기억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일하는 교도관이라는 그의 직업과 맞물려 소설의 분위기를 음산하게 형성한다. “나는 곧잘 어른들에게, 내가 어떤 여자를 살해했는지도 모른다, 라고 말했다. 내가 바다에서 여자를 살해했고,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어른들은 부정했다.”
나에게는 고교 시절 서로의 속내를 털어놓으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 마시타〔?下〕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알 수 없는 소리를 지껄이며 정신병 증세를 나타내고, 나는 보육원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게이코〔?子〕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그를 멀리하게 된다. “너는 나하고 비슷해. 엄청 닮았어. 그러니까 그냥은 못 넘어가. 그냥은 못 넘어간다고. 눈을 큼직하게 뜨고 침을 튀기며 내게 바짝 다가들어 그렇게 내내 말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이미 그즈음부터 막다른 곳에 몰려 있었던 것 같다. 구름이 떨어져 내린다, 라고도 말했었다. 구름이 떨어져 내려와서 우리를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되면 도망치는 건 불가능해. 잘 들어, 똑똑히 위를 보라고.” 그러던 중 마시타는 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고 끔찍한 사체의 모습을 한 채 발견된다.
살인자를 바라보는 작가만의 독특한 시선
마시타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는 노트가 한 권 배달되어 온다. 흐트러진 글씨는 분명 마시타의 필체. 노트 안에는 사춘기의 초조함과 가정불화, 배출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나는 점점 더 괴로워진다. 잠들지 못하는 밤.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밤. 자살은 이른 아침 시간에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해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든다. 그 밤을 무사히 넘긴다면 다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 모닥불은 언제까지나 타오르리라. 모든 게 다 우울한 밤이라도.” 노트를 다 읽은 나는 친구의 부재로 인한 슬픔과 왠지 모르게 끓어오르는 세상을 향한 적의로 유원지에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만다.
하지만 이 모든 기억도 이제는 13전 일이고,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나는 그럭저럭 감옥에서 좋은 이미지의 교도관으로 근무 중이다. 어느 날 교도소에 열여덟 살의 나이로 신혼부부를 살해하고 여론의 거센 비난에 시달리는 야마이〔山井〕가 입소한다. 나는 처음에는 그에게 큰 관심이 없다. 하지만 아주 어렸을 때 잃어버린 동생으로 기억되는 남자아이와 동생처럼 여기던 죽은 마시타, 그리고 야마이의 이미지가 묘하게 겹치자, 나는 자꾸만 그에게 마음이 쓰인다.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야마이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야마이는 고아였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일 이유 따위가 될 리는 없었다. (……) 야마이의 몸뚱이는 얇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알송알 나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도 땀을 흘리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야마이가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한 것을 계기로 나는 그와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 왜 신혼부부를 살해했는지, 어떤 성장과정을 거쳤는지, 지금의 심정은 어떤지, 야마이는 변호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이야기를 나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한다. “옛날 옛날부터, 처음 태어날 때부터, 얻어터지는 데도 쥐어 패는 데도 벌써 익숙했어. 그놈들이 나를 때려. 그러면 나는 고양이나 그런 걸 때려. 나는 그런 거, 벌써 익숙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어.” 태어난 직후 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도 학대당하던 야마이는 그 또래에 맞는 마땅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이 모호해진 채 욕망에 이끌려 신혼부부를 살해하고, 특별한 반성이나 자책 없이 죽는 날만을 기다려온 것이다.
나는 야마이와 마찬가지인 고아 출신이었으나, 보육원에서 좋은 원장님을 만나 괜찮게 성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였을 뿐, 자신도 그렇게 세상에 방치되었다면 야마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나는 생각해본다. 원장님은 나에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준다. “너는 아메바 같은 거였어. 알기 쉽게 말하자면 (……) 현재라는 건 어떤 과거도 다 이겨버리는 거야. 그 아메바와 너를 잇는 무수한 생물의 연속은, 그 수십억 년의 끈이라는 엄청난 기적의 연속은, 알겠냐, 모조리 바로 지금의 너를 위해 있었단 말이야.”
보육원의 원장님이 어린 시절 베란다에서 떨어지려던 자신을 커다란 손으로 붙잡아주었던 기억을 상기하며, 나는 야마이에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 좋은 것들을 알려주고자 결심한다. 야마이는 감옥에서 내가 권한 책이며 음악을 듣고, 사람을 죽인 자신이 이런 즐거움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번민과 세상을 좀 더 알고 싶고, 살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며 판결을 기다린다.
● 작품 해설
죽이기 위해 끌고 가고 그것이 잘한 기능이 된다는 것은 또 얼마나 역설적인가? “세상(사회)이 그때그때 자기들 멋대로 결정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교도관 주임의 말처럼 윤리적 개인도, 자각한 개인도 없다. 그런데도 사회는 제멋대로 잘 굴러간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마. 그런 어려운 고민이나 성찰 따위는 우리 사회에 맡기고 너희 개인들은 그저 묵묵히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 그래야지 개인이 아닌 사회와 우리 그리고 전체가 잘 돌아가니까 말이야. 부디 내 말 명심해. 고민하면 너만 우울해져. 개인이 다치는 건 용서가 돼도 사회가 다치는 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 너도 우울 따위는 던져버려. 그리고 마냥 개미들처럼 살기만 해. 우리가, 사회가, 전체가 페로몬을 팍팍 뿌려줄 테니 말이야. 항우울제도 있잖니? 그저 멍하니 오락프로그램만 봐. 그럼 행복해질 거야.
– 박성원(소설가, 동국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