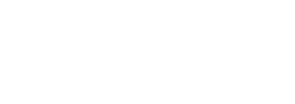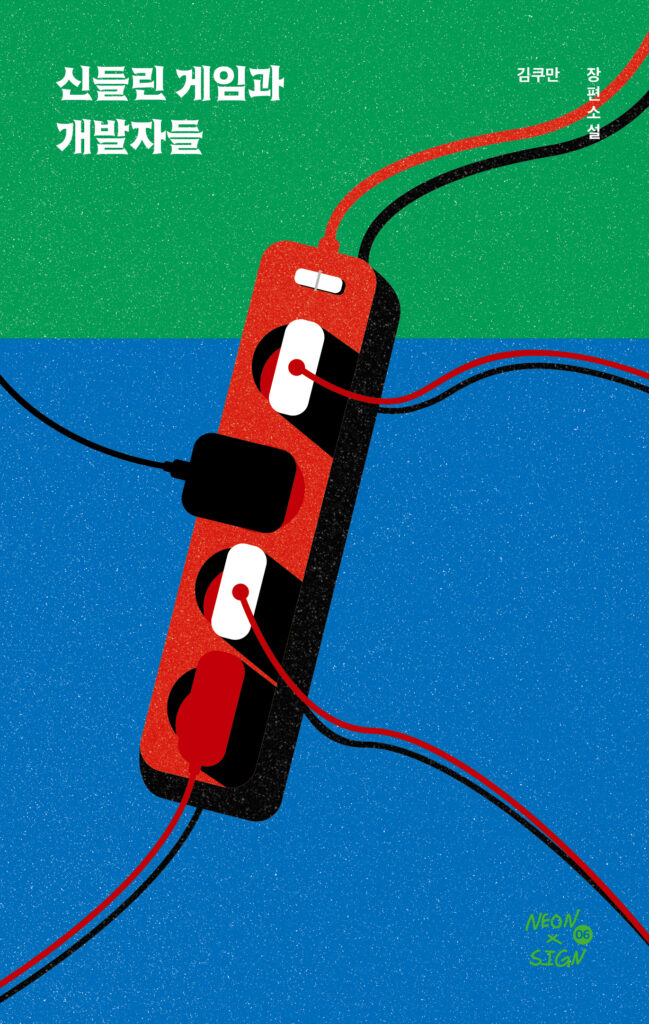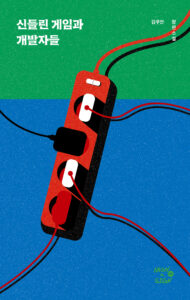
■■■ 책 소개
“살면서 귀신 한 번쯤은 봐야 성공할 수 있어.”
온갖 귀신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들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감각적인 소설을 빠르고 가볍게 만나는 새로운 신호 〈네온사인〉의 여섯 번째 책 『신들린 게임과 개발자들』이 출간되었다. 2022년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으로 SF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김쿠만 작가의 첫 장편소설이다.
이야기는 어느 신입 사원의 게임 회사 취업기를 다루며 시작된다. 그는 취업하자마자 호러 게임의 귀신 캐릭터 설정을 ‘맛깔나게’ 만드는 일을 맡는다. 여느 신입 사원이 그렇듯, 그가 할 줄 아는 일은 많지 않음에도 말이다. 게임이 출시되기까지 정신없이 휘몰아치는 업무와 안하무인 상사들 그리고 개발실에 나타난 귀신들까지. 『신들린 게임과 개발자들』은 직장인의 ‘현실 업무일지’와 SF적 상상력이 적절히 혼합되어 색다른 장르소설을 원한 독자라면 누구든 매력을 느낄 수 있을 작품이다.
■■■ 책 내용
게임 회사 n개월 차 신입 사원
소설가 대호 씨의 일일
문창과를 나온 소설가 지망생은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많은 직업군이 있겠지만 주인공 대호는 한 중견 게임 회사의 시나리오 팀으로 흘러 들어간다. 회사는 가상현실에 등장하는 귀신들을 무찌르는 게임 〈Project G〉를 만드는데, 대호의 업무는 그 귀신들의 설정을 만드는 일이다. 그것도 아주 맛깔나게. 소설을 쓰려 했던 대호는 이제 귀신들의 설정을 쓰며 기괴한 게임업계에 점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다. 입사 후 대호가 한 첫 질문에 대한 본부장의 답은 다음과 같다.
“〈Project G〉의 G가 무슨 뜻인지 여쭤도 될까요?”
“되고 말고. 그 G는 굿에서 따왔네, 굿.”
“Good이요?”
“아니, 영어 말고. 무당이 하는 굿.” (20쪽)
귀신과 굿과 게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세 단어처럼 대호의 업무는 어지럽게 돌아간다. 출근 첫날부터 야근은 물론이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귀신과 대화하거나 사무실에 무당이 찾아오는 해괴한 광경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이처럼 이상함을 감지할 새도 없이 바삐 돌아가는 개발실에서, 게임 캐릭터가 아닌 진짜 귀신이 나타난대도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겁을 먹고 퇴사하거나, 게임처럼 때려잡거나, 그것도 아니면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면 그만이다.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현실을 대호는 받아들이기로 한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기 때문이다. 그저 묵묵히 견디며 오늘도 내일도 귀신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대호는 “살면서 귀신 한 번쯤 봐야 성공할 수 있”다는 본부장의 말처럼 언젠가 다가올 대운을 기다리며 오늘도 차곡차곡 긁은 복권을 쌓을 뿐이다.
대호의 두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본부장의 답은 다음과 같다.
“야근수당 있나요?”
“우리 포괄이야.” (21쪽)
취업, 가상현실 그리고 귀신
보이지 않는 공포로 직조하는 리얼리즘
『신들린 게임과 개발자들』을 읽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 더 이상 소설로만 읽히지 않는다. 다시 말해 신입 시절을 겪은 회사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이 작품 곳곳에 있다. 아무리 귀신을 밥 먹듯 마주치더라도 야근과 정리해고가 주는 공포를 상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작품이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의 영역을 서슴없이 넘나드는 탓에 독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오랜 기억을 끄집어내게 되고 이야기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
“회사원은 누구나 잘리죠.”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어쩐지 팀장의 목소리에서 무덤덤이 아니라 쓸쓸함이 느껴졌다. 내 착각일지도 모르겠지만. (142쪽)
취업과 가상현실과 귀신은 모두 눈앞에 실재하지 않는 무언가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울 수도 있는 무언가이기도 하다. 덕분에 독자는 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작품에 녹아 있는 공포와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다. 작품은 실재하지는 않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어떤 결과를 빚어내는지 등장인물들을 통해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떤 망령은 게임 캐릭터였고 어떤 망령은 게임 개발자였으며 또 어떤 망령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자들이었다. 망령들은 회사에서 회사로, 또다시 회사에서 회사로 발을 움직였다.” (155쪽)
대호는 게임 속 귀신들을 만들어내며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한다. 자신이 이 귀신들과 다를 게 무엇인가.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망령처럼 테크노밸리 이곳저곳을 배회하게 되는 것인가. 『신들린 게임과 개발자들』은 이렇듯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공포를 무덤덤하게 끌고 와 선보인다. 게임 속 귀신과 게임 밖 대호가, 소설 속 대호와 소설 밖 우리로 연결되는 순간을 눈으로 확인하기를 바란다. 작품의 리얼리즘이 주는 현실적 공포를 안고 마지막 장을 덮을 수 있을 것이다.
■■■ 네온사인 시리즈
새로운neon 장르로 보내는 다양한 신호sign
〈네온사인〉은 SF와 미스터리, 판타지 등 감각적인 소설을 빠르고 가볍게 만나는 새로운 신호입니다. MZ세대 독자들에게 밀도 높은 서사, 흡입력 있는 세계를 콤팩트하게 선사합니다. 강렬한 색으로 다양한 빛을 내는 네온사인처럼, 새로운 이야기로 비추는 우리의 신호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 지은이
김쿠만
1991년 출생. 2020년 웹진 『던전』에 입장했고, 2021년 문예지 『에픽』에 등장했으며, 2022년에 소설집 『레트로 마니아』를, 2024년에 장편소설 『신들린 게임과 개발자들』을 책장에 꽂았다. 「옛날 옛적 판교에서는」으로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 가작, 「장우산이 드리운 주일」로 제16회 쿨투라 신인상을 수상했다.
■■■ 차례
Tutorial
Project G
DLC
작가의 말
■■■ 책 속으로
중견 게임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넣고 2주 만에 인사 팀으로부터 함께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곳의 잡플래닛 리뷰 점수가 2.5점을 넘지 않는 데다 결과를 기다리는 곳이 아직 다섯 곳 넘게 남았지만 나는 제안에 응했다. 나에게 연락이 올 회사가 더 없을 것이라는 짐작도 있었고, 언제까지나 소설 쓴답시고 부모님 재산을 축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_15쪽
엄마는 내 등 뒤에 달라붙은 것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건 뭐니?”
“내가 디자인한 귀신이야.”
내 대답을 듣고 아빠가 다른 질문을 던졌다.
“너 게임 회사 다니지 않니?”
“맞아, 얘도 게임 속에 나올 애야.” _35쪽
하지만 캄캄한 사무실에서 마주친 상대는 그 자부심을 손쉽게 부술 정도로 커다랬다. 족히 2미터도 될 법한 키였는데, 개발실의 모든 팀원을 알고 있던 PM 팀장의 기억 속에 그렇게나 큰 팀원은 없었다. 그런 고로 이 작자의 정체는 두 가지로 축소됐다. 무단침입자이거나 아니면 개발실에 소문이 퍼진 예의 그 귀신이거나. 어느 쪽이든 전혀 달가운 존재는 아니었다. _60쪽
“제가 다룰 다음 주제는 ‘굿’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취재진들은 코지마 히데오의 첫 마디를 듣고 의아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굿’이라곤 영어 단어인 ‘Good’밖에 없으니까. 때문에 이런 멍청한 질문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정확히 뭐가 좋다는 겁니까?” _85쪽
나는 넋이 나간 귀신처럼 취해버린 팀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대호 씨는 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귀신 같아요.”
내가 답하자마자 팀장은 시선을 잠깐 흩뜨리더니 그대로 테이블에다 고개를 처박았다. 팀장이 내 대답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내가 그를 집으로 보내야 하는 건 알 수 있었다. _106쪽
경찰의 조사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게임 캐릭터에겐 공소권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형사의 말을 들으니 먼젓번 브라기가 실종됐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도 경찰들은 조사를 대충대충 했고, 결국 브라기를 찾은 건 나였다.
“그러면 게임 캐릭터가 살인을 저지르면요?”
“삭제하면 되죠. 따지고 보면 그게 사형 아닙니까?” _125~126쪽
“그 아저씨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요?”
“저희랑 다를 바가 없겠죠.”
“귀신같은 존재가 됐군요. 저번에 무당이 그러던데. 귀신은 자신이 귀신이 된 줄 모르고 배회한대요.”
“본부장처럼요?”
팀장은 씁쓸한 커피를 마신 다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끝맺었다.
“아니요, 우리처럼.” _145쪽
면접을 본 지 정확히 10분이 지났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시죠.”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감사합니다.” _1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