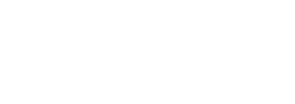한 편의 노래는 여러 번 다시 태어난다
〈사의 찬미〉 〈비 내리는 호남선〉 〈동백아가씨〉 〈왜 불러〉 〈봉우리〉……
우리 시대 대표적인 논객이자 시인 김형수가 써 내려간 그 시절 유행가들에 담긴 정서와 사회상
프롤로그 – 유행가들에 대한 짧은 노트
1부 유행가 지대
2부 어릴 때는 어린 노래가 있었다
3부 20세기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
4부 해도 달도 뜨지 않는 광주역
덧붙이는 말
노래의 생명력은 노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
신민요와 트로트, 청년문화와 통기타 그리고 광주
『유행가들』은 총 5개의 부로 나뉘어져 대체적으로 시대순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꽤 긴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유행가들에 대한 짧은 노트’에서는 우리나라가 트로트의 나라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당시 불렀던 노래들을 일별한다. 그렇게 “유행가에 얽힌 추억담을 늘어놓다 보면 다들 시간의 마술에 속고” 만다고 고백하는데, “옛날이 오늘이 되고 노래 속의 풍경들이 갑자기 나의 것으로 돌변”(17쪽)한다고 작가는 표현한다.
1부 ‘유행가 지대’는 유행가가 어떤 지대에 있는지 어떤 위치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짧은 글이다. “본능적으로 고향에 가고 싶거나 헤어진 연인이 견딜 수 없이 떠오르거나 마음의 상처가 덧나기만 할 때”(35쪽)처럼 (시로도 감당하지 못할) 노골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날것’의 예술이라고 덧붙인다. 2부 ‘어릴 때는 어린 노래가 있었다’부터는 본격적으로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며, 일제강점기에서부터 1970년대까지를 회고한다. 해방과 분단 상황까지는 [황성옛터] [눈깔 먼 노다지] [노들강변] [목포의 눈물] [감격시대] 등을 소환하고, 그 후 시대를 풍미했던 신중현과 이미자 그리고 김추자를 추억해낸다.
1960년대를 풍미했던 숱한 기라성 중에 나의 귀에 가장 많이 닿은 목소리는 단연 이미자의 것이다.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다는, 그 이름 세 자로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가수. 아마 한국에서 1960~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 모두에게 거의 완벽하게 전파된 낭설이 아닐까 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미자에 대해 두 개의 소문을 듣고 자랐다. 하나는 전쟁통에 고아처럼 버려져 울다 못해 그만 목청이 터져버렸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그의 목을 연구하기 위해 죽으면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었다.(106~107쪽)
3부 ‘20세기의 청년들이 부르던 노래’에서는 1970~1980년대 청년문화를 다룬다. 통기타와 청바지와 맥주로 대표되는 세대 감성. 그때 한국의 거리는 반항적 낭만주의로 가득 찼고 취미 생활자와 재능기부자 같은 모습의 뮤지션들 덕에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젊음의 연대감을 함께 누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이미 ‘대중의 아마추어화’ 현상이 발아되었다는 점이다. 포크송 가수들이 보여주는, 대단한 악단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통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는 문화야말로 듣는 자를 ‘절대적 수용자’로만 존재할 뿐 창조의 주체로 나설 수 없게 하던 이전 세대의 풍속을 일거에 전복하는 것이었다.(158쪽)
송창식과 양희은 김민기 등으로 대표되는 이 시기, 광주에서는 잊히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에도, 그 이후에도 그날을 기리며 노래는 불리었다. 4부의 무대는 광주다. 작가는 1980년 5월, 스물두 살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때를 회상한다. “5?18 때 광주 시위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창된 가요는 양희은이 부른 [늙은 군인의 노래]였”고 “당시 대학생들은 이를 [투사의 노래]로 개사했지만 시민들의 태반은 따라 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도 호출된 노래가 [전남도민의 노래]”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전라도 사람을 통째로 역도 취급을 하는 동안 민간인 공동체에서는 관제 향토 가요가 애국가가 되었”(185쪽)던 것이다.
『유행가들』에는 작가의 소소하고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진솔한 고백의 문장들로 가득하다. 가수 김광석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담담하게 회상하기도 하고, 1990년대적인 것들과 불화했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기도 하면서, 노래에 대해서 진실한 사랑을 표현한다. 노래의 생명력은 노래 자체에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는 듯이. 마음을 다해 노래를 불러온 작가는 마음을 다해 노래에 대한 애정을 담아 『유행가들』을 선보인다.
작가의 말
이 책은 내가 음악을 잘 알아서 쓰게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살아오면서 라디오, 전축, 녹음기 따위를 가져본 적이 없다. 인간의 마을에서 떠다니는 숱한 소리들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음악의 전부였다. 하지만 내 삶은 시대의 오지에서 한참 뒤떨어진 풍속사의 현장을 절묘하게 놓치지 않고 통과해왔다. 주막집 아들로 태어나 유년 시절을 온통 유랑극단의 노래들 속에서 보냈으며, 학교에 들어가서는 집 뒤에 극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노래를 날마다 피하지 못하고, 또 나중에는 뮤직박스의 디제이를 했던 형에게 포크송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그리고 5·18을 겪은 이후 민중가요사가 그려가는 궤적을 현장에서 지켜보았다. 그 이름 없는 가객들에게 받았던 감동의 기억들은 내 영혼의 세포에 스며들어 오늘도 나와 함께 숨 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