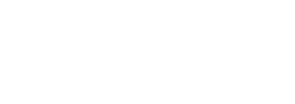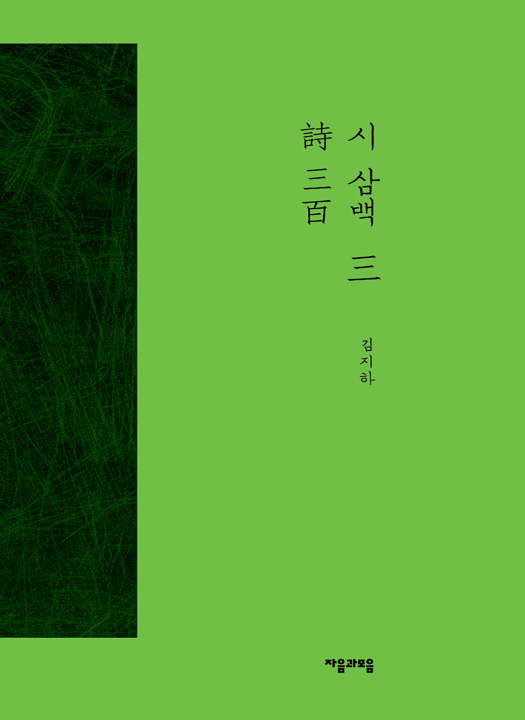거대한 사상가이자 뜨거운 시인 김지하의 역사가 담긴 시들을 만나다!
김지하 시인의 사상과 예술의 결정체가 담긴 시집 『시 삼백』시리즈 제3권. 「시 삼백」 시리즈는 김지하 시인의 최근 몇 년의 시작 중 305편을 모아서 엮을 시집으로 시인의 삶과 일상, 사상과 감성,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녹아있다. 의미와 압축, 어려운 수사를 사용하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녹여낸 시들은 시인의 빛나는 통찰로 인해 깊은 여운을 전한다. [제3권]
☞ 북소믈리에 한마디!
김지하 시인은 민족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으로서 도피와 유랑, 투옥과 고문, 사형선고와 무기징역, 사면과 석방 등 형극의 길을 걸어온 작가이다. 그는 독재 권력에 맞서 자유의 증언을 계속해온 양심적인 행동 시인으로 「국제시인회의 위대한 시인상」을 비롯해서 「이산문학상」, 「정지용문학상」등 굵직한 문학상을 대거 수상했다.
▶이 시집은 속지가 연두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하
저자 : 김지하
본명은 김영일이다. 1941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 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64년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에 가담해 첫 옥고를 치른 이래, 8년간의 투옥, 사형 구형 등의 고초를 겪었다. 독재권력에 맞서 자유의 증언을 계속해온 양심적인 행동인으로, 한국의 전통 사상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재창조하고자 노력하는 사상가로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룩했다. 시집으로는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애린’, ‘검은 산 하얀 방’, ‘이 가문 날의 비구름’, ‘별밭을 우러르며’, ‘중심의 괴로움’, ‘화개’ 등이 있고, ‘밥’, ‘남녘땅 뱃노래’, ‘살림’, ‘생명’, ‘생명과 자치’, ‘사상기행’, ‘예감에 가득 찬 숲그늘’, ‘옛 가야에서 띄우는 겨울편지’, 대설(大說) ‘남’, ‘김지하 사상전집(전3권)’, ‘김지하의 화두’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 로터스 특별상(1975), 국제시인회의 위대한 시인상(1981), 크라이스키 인권상(1981) 등과 이산문학상(1993), 정지용문학상(2002), 만해문학상(2002), 대산문학상(2002) 등을 수상했다.
興172 나 이제 참으로 돌아간다 / 興173 내가 나를 잊을 때가 있어요 / 興174 어젯밤에 / 興175 바로 오늘 / 興176 이름 없는 하얀 꽃 / 興177 긁다 / 興178 땅 / 興179 사랑 / 興180 내 길 / 興181 공부 / 神182 오늘 / 神183 세상 / 神184 그날 / 神185 태평양 너머 / 神186 곤지암을 떠나며 / 賦187 나 오늘 / 賦188 아련한 에로스가 / 興189 그리움 / 興190 제로 포인트 / 興191 어딘가에서 / 興192 새날 / 땡193 묘연 / 뚱194 아버지 / 땡195 촛불 / 뚱196 차분한 이튿날 / 뚱197 이렇게 / 뚱198 서푼짜리들 / 땡199 땡 199 / 똥200 귀환 / 똥201 신 / 땡202 겸 / 땡203 밤새 / 뚱204 흰 빛 / 뚱205 혼자 / 땡206 지난 밤 / 뚱207 누군가 / 뚱208 아삽의 시편 / 땡209 오대산 / 똥210 망각 / 뚱211 독좌대웅봉 / 땡212 한 학생 / 똥213 어둠 속에서 / 뚱214 두 사람 더 있다 / 똥215 속으로부터 / 땡216 윤초 1 / 땡217 윤초 2 / 땡218 윤초 5 / 땡219 윤초 14 / 땡220 윤초 20 / 땡221 윤초 22 / 뚱222 오늘 낮 / 땡223 내일 아침에 / 땡224 아마 처음으로 / 뚱225 설명하지 마 / 뚱226 헤어지려 했으나 / 땡227 윤초 뒤 이레 만의 나의 윤초 / 똥228 겉소리 따라 / 똥229 속소리 따라 / 땡230 첫 이마에 / 땡231 무려 여덟 시간 동안 / 똥232 흰 그늘 / 땡233 누가 나에게 와서 / 땡234 그분께 / 똥235 내가 나를 때리는 / 똥236 남과 북에서 / 땡237 새벽 두시 / 똥238 언제 어디서 / 땡239 기도 / 똥240 암호 / 땡241 달 / 땡242 반달 / 땡243 땡 26 / 땡244 아침 / 땡245 땡 27 / 땡246 땡 29 / 똥247 동롯텔담 / 땡248 땡 31 / 땡249 땡 20 / 땡250 땡 32 / 땡251 땡 21 / 땡252 땡 33 / 땡253 땡 22 / 땡254 땡 35 / 땡255 땡 36 / 땡256 땡 37 / 땡257 땡 43 / 땡258 땡 45 / 땡259 땡 46 / 땡260 땡 49 / 땡261 땡 52 / 땡262 땡 53 / 똥263 땡 54 / 뚱264 땡 55 / 땡265 땡 56 / 뚱266 땡 57 / 똥267 땡 58 / 땡268 땡 59 / 땡269 땡 60 / 똥270 땡 61 / 뚱271 땡 62 / 땡272 땡 63 / 땡273 땡 64 / 땡274 땡 65 / 뚱275 저녁의 바람 / 땡276 앙금산 / 뚱277 빈터 / 뚱278 바람의 진리 / 똥279 물을 찾아서 / 똥280 삿갓봉 아래 / 똥281 백암 / 뚱282 고개를 돌린다 / 땡283 수왕고 / 똥284 흰 그늘 / 똥285 2012년 / 뚱286 구름 속의 달 / 땡287 엄마의 편지 / 뚱288 엄마 보옵소서 / 땡289 욕 / 뚱290 겸 1 / 뚱291 겸 2 / 뚱292 겸 3 / 땡293 겸 4 / 똥294 노겸 / 똥295 짝퉁은 즐거워 / 똥296 신의 기원 / 뚱297 겸개벽 / 똥298 거기 / 똥299 애쓰는 못난이 / 똥300 카비르 / 땡301 남쪽 고향에 / 뚱302 괴산 사람이 / 똥303 시작 / 땡304 귀향 / 땡305 여덟 발걸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어떻게?
시의 한 양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양식에 여러 가지 지향을 담아 그야말로 달이 천 개의 강물에 다 다른 얼굴로 비치되 작은 먼지 한 톨 안에도 우주가 살아 생동하도록 그렇게.
여러 해 전 나는 공자가 당대 민초들의 찬가나 정치적 비판시 이외에도 노래와 이야기와 교훈적인 시들을 엇섞어 ‘시삼백’의 백화제방을 시경으로 들어 올렸음이 당대 문예의 한 방향 제시였음을 기억해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아시안 네오 르네상스는 우선 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시삼백’을 원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먼저 나 자신부터 천태만상이니 어쩌랴!
(…중략…)
그래 내 좋아하는 문학이론가 홍용희 교수에게 어느 날, ‘당신이 공자 노릇을 해라. 내가 민초 노릇을 하겠으니 한번 내 뒤죽박죽 시작들 속에서 시삼백을 건져내보라!’ 그래서 나의 수백 편의 최근 시편들을 이야기[賦], 노래[興], 교훈적인 것[比], 풍자[諷], 초월적인 명상[神]의 다섯 가지 양식으로 먼저 홍 교수가 갈라냈다. 그런데 홍 교수의 ‘시삼백’을 내가 다시 검토하면서 내 자신이 크게 놀라게 되었다. 물론 홍교수가 손댄 원고 뭉치 이외에도 수많은 시고들이 그 밖에 또 있어서이지만 좌우간 ‘부, 흥, 비, 풍, 신’ 말고도 무엇으로 갈래 짓기 힘든 매우 복잡한 지향의 컴컴한 새로운 양식적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마구니 같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서다.
(…중략…)
홍 교수가 갈래 지은 이백 편은 그대로 ‘부, 흥, 비, 풍, 신’으로 나아가되 그 밖에 백 편 정도는 다시 우선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땡’, ‘똥’, ‘뚱’으로 이름 붙여 재구성하기로 했다.
‘땡’은 물론 우리 집 고양이 김막내의 별명으로 ‘중생시(衆生詩)’의 양식이고, ‘똥’은 좀 구린내 나는 상상력의 영역, 이른바 흰 그늘이 조금 심한 편을, 그리고 ‘뚱’은 세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는 데에 영 재미가 없는 그런 차원을 지적하는 것이겠다. 앞으로 이러한 지향이 다시 어떤 특정한 장르로까지 발전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난 잘 모르겠다.
김지하(사상가,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