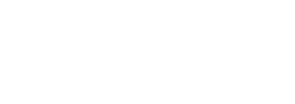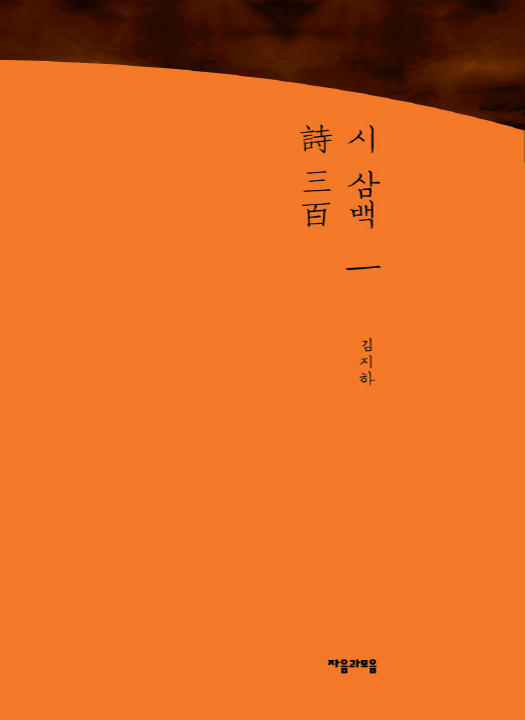거대한 사상가이자 뜨거운 시인 김지하의 역사가 담긴 시들을 만나다!
김지하 시인의 사상과 예술의 결정체가 담긴 시집 『시 삼백』시리즈 제1권. 「시 삼백」 시리즈는 김지하 시인의 최근 몇 년의 시작 중 305편을 모아서 엮을 시집으로 시인의 삶과 일상, 사상과 감성,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녹아있다. 의미와 압축, 어려운 수사를 사용하지 않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야기를 녹여낸 시들은 시인의 빛나는 통찰로 인해 깊은 여운을 전한다. [제1권]
☞ 북소믈리에 한마디!
김지하 시인은 민족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으로서 도피와 유랑, 투옥과 고문, 사형선고와 무기징역, 사면과 석방 등 형극의 길을 걸어온 작가이다. 그는 독재 권력에 맞서 자유의 증언을 계속해온 양심적인 행동 시인으로 「국제시인회의 위대한 시인상」을 비롯해서 「이산문학상」, 「정지용문학상」등 굵직한 문학상을 대거 수상했다.
▶이 시집은 속지가 주황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하
저자 : 김지하
본명은 김영일이다. 1941년 전남 목포에서 태어나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 1969년 ‘시인’지에 ‘황톳길’ 등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1964년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에 가담해 첫 옥고를 치른 이래, 8년간의 투옥, 사형 구형 등의 고초를 겪었다. 독재권력에 맞서 자유의 증언을 계속해온 양심적인 행동인으로, 한국의 전통 사상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재창조하고자 노력하는 사상가로서 독보적인 업적을 이룩했다. 시집으로는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오적’, ‘애린’, ‘검은 산 하얀 방’, ‘이 가문 날의 비구름’, ‘별밭을 우러르며’, ‘중심의 괴로움’, ‘화개’ 등이 있고, ‘밥’, ‘남녘땅 뱃노래’, ‘살림’, ‘생명’, ‘생명과 자치’, ‘사상기행’, ‘예감에 가득 찬 숲그늘’, ‘옛 가야에서 띄우는 겨울편지’, 대설(大說) ‘남’, ‘김지하 사상전집(전3권)’, ‘김지하의 화두’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회의 로터스 특별상(1975), 국제시인회의 위대한 시인상(1981), 크라이스키 인권상(1981) 등과 이산문학상(1993), 정지용문학상(2002), 만해문학상(2002), 대산문학상(2002) 등을 수상했다.
서문 이제 이렇게 / 賦1 고양이에게 책을 / 賦2 암호문자 / 賦3 서럽고 서러운 / 賦4 강토봉재 / 賦5 노사나 주점 / 賦6 곤충의 작가에게 / 賦7 오고 있는 저 차 / 賦8 화엄개벽의, 그 개벽의 길에서 / 賦9 오히려 / 賦10 시 2009 / 賦11 묘연 / 賦12 타는 목마름으로 살던 때는 / 賦13 설날 아침 / 賦14 쌩목 / 賦15 내가 태어난 곳은 / 賦16 나에게 물을 / 賦17 시경에서 밥 한술 / 賦18 모성 / 賦19 한번은 / 賦20 이 끝없는 길을 1 / 賦21 이 끝없는 길을 2 / 興22 내가 나에게 너에게 또 우리에게 그들에게 / 興23 새벽 편지 / 興24 나에게 / 興25 누나 / 興26 내가 나에게 / 興27 님 / 興28 나의 나 / 興29 한 / 興30 태풍 / 興31 서너 뼘 남은 인생 / 興32 짧은 여행 / 興33 꽃샘 없는 봄 / 興34 독항아리 / 興35 무의식을 따라 산다 / 興36 시인들 / 興37 복갈퀴 / 興38 다리 밑에서 / 興39 별과 꽃 속에서 / 興40 어차피 / 興41 사과 / 興42 오늘 낮 / 興43 운문사 근처에서 / 興44 거두어 갈아 심으리 / 興45 모심 / 興46 지금 여기서 / 興47 님 / 興48 높은 터 / 興49 가시는 듯 다시 오소서 / 興50 회음의 푸른 별 / 興51 이 끝에 / 興52 인의예지 / 興53 이야기, 노래, 뜻 그리고 바람과 귀신 / 興54 서정춘이 김지하에게 / 風55 빨간 볼펜을 좋아하는 까닭은 / 風56 요즈음의 공자 / 風57 학이시습 / 神58 고양이 선생님 / 神59 우리 집 막내 / 神60 다시 월파정에 와서 / 神61 까치집 / 神62 머언 알혼섬 / 神63 어느 한밤에 / 神64 첫 유리 / 神65 밀교 / 神66 선 / 神67 나의 윤초 / 比68 그리고 또한 / 比69 나의 살던 고향은 / 比70 영화에 대해서 / 比71 속소리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어떻게?
시의 한 양식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양식에 여러 가지 지향을 담아 그야말로 달이 천 개의 강물에 다 다른 얼굴로 비치되 작은 먼지 한 톨 안에도 우주가 살아 생동하도록 그렇게.
여러 해 전 나는 공자가 당대 민초들의 찬가나 정치적 비판시 이외에도 노래와 이야기와 교훈적인 시들을 엇섞어 ‘시삼백’의 백화제방을 시경으로 들어 올렸음이 당대 문예의 한 방향 제시였음을 기억해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아시안 네오 르네상스는 우선 시에 있어서 또 하나의 ‘시삼백’을 원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하고 복잡하다.
먼저 나 자신부터 천태만상이니 어쩌랴!
(…중략…)
그래 내 좋아하는 문학이론가 홍용희 교수에게 어느 날, ‘당신이 공자 노릇을 해라. 내가 민초 노릇을 하겠으니 한번 내 뒤죽박죽 시작들 속에서 시삼백을 건져내보라!’ 그래서 나의 수백 편의 최근 시편들을 이야기[賦], 노래[興], 교훈적인 것[比], 풍자[諷], 초월적인 명상[神]의 다섯 가지 양식으로 먼저 홍 교수가 갈라냈다. 그런데 홍 교수의 ‘시삼백’을 내가 다시 검토하면서 내 자신이 크게 놀라게 되었다. 물론 홍교수가 손댄 원고 뭉치 이외에도 수많은 시고들이 그 밖에 또 있어서이지만 좌우간 ‘부, 흥, 비, 풍, 신’ 말고도 무엇으로 갈래 짓기 힘든 매우 복잡한 지향의 컴컴한 새로운 양식적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마구니 같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서다.
(…중략…)
홍 교수가 갈래 지은 이백 편은 그대로 ‘부, 흥, 비, 풍, 신’으로 나아가되 그 밖에 백 편 정도는 다시 우선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조금 애매한 말이지만 ‘땡’, ‘똥’, ‘뚱’으로 이름 붙여 재구성하기로 했다.
‘땡’은 물론 우리 집 고양이 김막내의 별명으로 ‘중생시(衆生詩)’의 양식이고, ‘똥’은 좀 구린내 나는 상상력의 영역, 이른바 흰 그늘이 조금 심한 편을, 그리고 ‘뚱’은 세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사는 데에 영 재미가 없는 그런 차원을 지적하는 것이겠다. 앞으로 이러한 지향이 다시 어떤 특정한 장르로까지 발전할 것인지는 지금으로서는 난 잘 모르겠다.
김지하(사상가,시인)